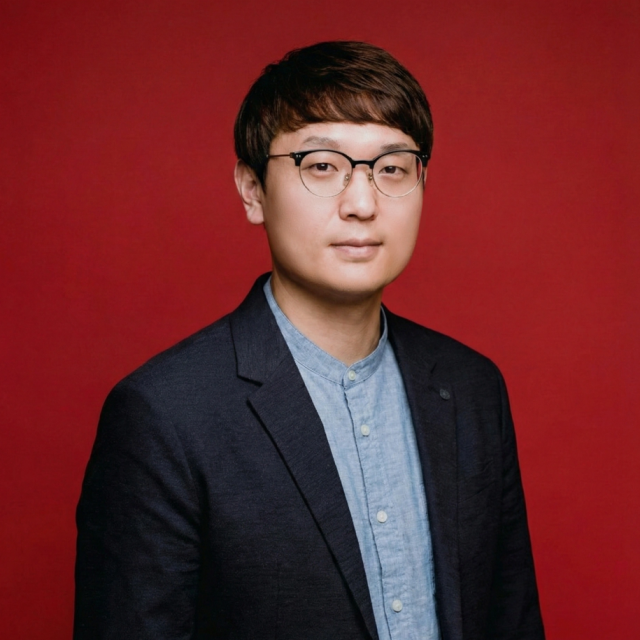1980년대 초반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료기기 판매원인 크리스 가드너는 한 달 방세조차 내지 못해 아들과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존 인물인 그는 매일매일이 처절했다. 잠잘 곳이 없어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던 그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희망은 무보수 인턴직으로 시작하는 주식 중개인이었다.
영화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크리스 가드너를 분한 윌스미스의 면접 장면이었다. 거지꼴을 하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면접관들의 인상은 당연히 구겨졌다. 그리고는 면접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가 셔츠도 입지 않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을 고용한다면 이유가 뭐겠나?"
라는 질문에 윌 스미스는 이렇게 답한다.
"바지는 끝내줬나 봅니다."
센스 있는 답변에 무거웠던 면접장의 분위기는 밝아졌다. 탈락의 반전을 이룬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광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모두가 초라하다고 말할 때, 브랜드는 본질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겉모습을 말할 때, 브랜드는 속모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광고에는 필수적으로 어떠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 집의 첫 차는 내가 창업 후 번 돈으로 산 250만 원짜리 중고차였다. 그래서 학창 시절, 집에 차가 없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던 것 같다. 한참 사춘기 때니 그럴 만도 했다.
그때 나는 가난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래 우리 집에 차가 없으니 차가 있는 집보다 더 건강할 수 있겠다. 항상 걸어 다녀야 하니 살도 안 찌고 좋네'라고 말이다.
사실의 부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였다면 나는 어쩌면 삐뚤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늘 사실 너머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연습을 했다.
더 불편하지만 그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뒤집어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놀랍게도 그런 훈련들은 내가 훗날 광고인이 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
광고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미지가 별로인 브랜드를 맡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어차피 학창 시절 내내 했었던 습관들이라 그런 작업들이 쉽게 느껴졌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브랜드가 참 멋진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서운해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행복을 찾아서의 윌 스미스 면접 장면를 떠올려보자.
"셔츠가 별로라고?
네가 몰라서 그래.
난 정말 멋진 바지를 입었단 말이야".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