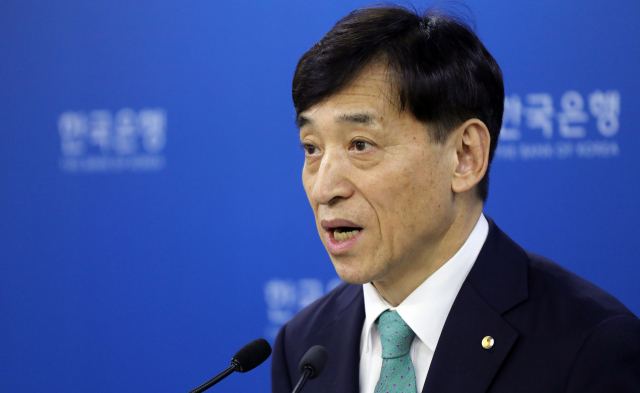
금리인상을 고심 중인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만 남겨둔 상태에서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디데이'를 10월 18일로 할지, 11월 30일까지 기다릴지 고심 중이다. 올해를 그냥 넘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통위에서는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10월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금리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지표다. 물가와 고용, 심리지표 등을 두고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
10월 금통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만약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리게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 견조한 성장세'라는 점을 내세우기가 머쓱해진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말해왔다.
외부 기관에서도 성장률 하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로 떨어뜨렸다.
반면 한미 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회의에서 내년에도 인상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한미 금리차는 이미 0.75%포인트가 목전이고 이대로라면 내년엔 1%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물론 미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불안을 촉발해서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변수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급등과 연계돼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동향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큰 칼'인 통화정책을 부동산만 겨냥해 쓸 순 없다. 지방은 온도가 다르다는 점도 금리 카드 사용을 주저케 한다.
내년 경제로 초점이 옮겨가며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