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랑캐 땅에선 못산다"전국 순국투쟁 70명…안동서만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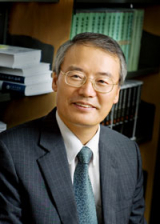
바다를 밟고 들어가 사라진 인물이 있다.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여자'라는 소설 제목은 들어 봤어도 실제 바다를 밟고 들어가 목숨을 던진 인물이 있을 줄이야.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남쪽 바닷가에 도해단(蹈海壇)이라는 바위 언덕이 있고, 거기에 기념비가 서 있다.
도해라는 말은 중국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한다면 바다를 밟고 들어가 죽겠다고 저항했던 중국 제나라 노중련의 이야기에 나온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 영해에 실제로 목숨을 던져 절의를 지킨 인물이 있었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출신 김도현이 바로 그다. 나라 잃은 선비의 비감한 마음과 겨레에 바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그렇게 순국했다.
김도현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09년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른 의병장으로 유명하다. 나라가 무너지던 1910년 그 가을에 스승인 향산 이만도가 단식에 들어가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스승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가'라고 제자를 말렸다. 제자는 뒷날 따르겠다고 다시 힘주어 답했다.
스승인 이만도는 안동 도산면 하계마을 사람이다. 일찍이 과거에 장원급제해 양산현령을 지낸 그는 1895년 예안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었다. 나라가 망하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단식에 들어갔다. 2년 앞서 안동 풍산읍 수동 출신인 김순흠이 예천에서 자결하자 이만도는 나라를 위한 마지막 길을 헤아려 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라가 무너지자 오랑캐 땅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을 세웠고, 순국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는 곧 겨레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향산은 눈물로 음식을 권하는 가족과 집안사람, 친지와 제자들에게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를 가르치며 달랬다. 그러다가 2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향산이 단식을 하던 동안 그를 돌보며 지키는 가족은 먹어야했고, 이별하러 들르는 손님들도 맞아야 했다. 기가 막힌 나날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지켜낸 향산의 아들 이중업과 며느리 김락도 1910년대와 3·1운동, 그리고 파리장서를 통해 독립운동사에 우뚝선 부친과 시아버지를 따랐다. 더구나 향산의 손자와 손서까지 독립운동에 이름을 떨쳤다. 3대에 걸친 독립운동 명가를 이룬 출발점이 바로 이만도였다.
이만도의 단식 소식은 큰 물결을 만들어냈다. 순국하기 전날 안동 와룡면의 권용하가 자결했다. 또 이만도가 순국하던 날, 하계마을 옆집에 살던 집안 조카 이중언이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과거를 거쳐 사간원 정언을 지낸 이중언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리뿐'이라는 뜻을 세우고, 27일 단식 끝에 세상을 떠났다. 다시 봉화군 춘양면 내곡마을의 이면주가 음독자결하였으니, 이만도가 떠난 지 9일 만이었다. 그 뒤를 잇달아 안동 풍천면 하회에서 류도발, 풍천면 갈전에서 이현섭, 풍산 오미마을에서 김택진이 그 뒤를 따랐다.
순국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김도현이 다시 1914년 동짓날 차디찬 바닷가에 선 것이다. 영양에서 계몽운동을 펼치던 그는 부모님 상을 모두 치르게 되자 스승 이만도 앞에서 다짐했던 일을 실천에 옮기려고 나섰다.
고향을 떠나 백두대간을 넘어 영해 바닷가에 다다른 그는 절명시를 남기고, 따라온 조카에게 "결코 시신을 찾지 말라"고 이르고는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도해', 곧 바다를 밟고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곳에 가보면 암초가 삐죽삐죽 물속으로 뻗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미끄러운 돌부리를 밟으며 한 걸음씩 검푸른 바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 얼마나 엄숙하고 장렬한 장면인가.
목숨을 던진 저항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하회마을 류신영이 자결하였다. 그는 1910년 순국한 류도발의 아들이니 부자가 잇따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다.
또 예안 부포마을 출신 이명우 부부는 나라가 무너지자 고향을 떠나 속리산으로 들어가 살다가, 충남 진잠 송정(현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에서 1921년 1월(양력) 광무황제 대상을 마치던 날 순국했다. 남편은 충의를 위해 떠나는 뜻을 유서로 남겼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뜻을 좇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글 유서를 자녀들에게 남겼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부인은 그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난 것이다. 충과 의를 부부가 함께 택한 이런 순국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순국의 거센 저항은 이만도의 순국에서 본격적으로 비롯되었다. 스승과 제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저씨와 조카가 이어나간 투쟁, 그 처절하고도 웅대한 저항의 물결이 안동 문화권 일대를 휘감았다.
온 나라에 순국자가 70명 정도인데, 이곳 안동 땅에서 12명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는 대의명분과 의리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유교적 지식인의 삶과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희곤 안동대 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