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신 무기도 벌벌 떨었다, 그 불굴의 기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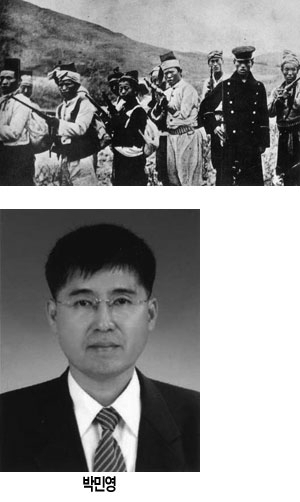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 날의 월드컵은 대표선수들만이 아닌 전 국민이 동참한 일대'거사'였다. 그 결과 4강 신화를 창조해 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경험한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근대 역사 속에도 '월드컵' 때와 같은 거사가 두 번 있었다. 1919년 3·1운동의 만세소리와 의병전쟁의 총성이 그것이다. 한말의 의병전쟁과 일제 강점기 3·1운동은 우리가 경험했던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역사상 같은 궤적을 갖고 있다. 물론 독립운동이 내용상 스포츠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세 거사 모두 전 민족의 힘이 응축되어 일시에 폭발했고, 강토에 울린 그 굉음이 전 세계를 경악케 했으며, 그 결과 역사·국가 발전에 촉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역사성을 같이 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의병전쟁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1910년 국치 전후까지 20년간 일제를 상대로 벌인 민족 성전(聖戰)이었다. 특히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07, 1908년에는 전 민족의 힘이 투입된 대일 전면전의 단계로 승화되었다. 악랄한 친일파 몇을 제외한 남녀노소 민족 구성원 모두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 성전에 음으로 양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병전쟁의 승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흔히 의병전쟁은 화승총(火繩銃)과 명치(明治) 38식 소총의 싸움으로 비유된다. 의병의 주력무기인 화승총은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사용하던 무기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개량된 것이었다. 화약과 철환(鐵丸)을 재고 화승대에 불을 붙인 뒤 조준사격 하는 순으로 격발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3, 4명이 분업식으로 사격했으며, 유효 사거리는 불과 50보인 100m 이내였고, 그나마 강선이 없어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다. 더욱이 눈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불을 붙이지 못해 총을 쏠 수 없었다. 이름만 총이지, 근대식 소총과는 거리가 먼 '고병기(古兵器)'였다. 이에 비해 일제 군경이 보유한 38식 소총은 1905년(명치 38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최신 무기였다. 볼트-액션식 격발장치를 갖춘 이 군총은 최대 사거리 3㎞, 유효 사거리 365m에 5연발식으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다.
이처럼 의병은 화력 면에서 일제 군경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최신 무기를 동원한 일제의 의병 탄압은 그야말로 대량학살이었다. 특히 1907년 8월 대한제국군 강제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전면전과 다름없는 단계에 접어들자, 일제는 2개 사단 규모의 정규군을 비롯해 헌병,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해 의병을 탄압했다. 의병전쟁의 양상은 그만큼 처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대참변과 다름없었다.
이름난 의병장을 필두로 일반 의병, 민간인 등 이 전쟁에서 줄잡아 10만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일제 군경의 탄압으로 최후를 맞이하던 의병의 모습은 참으로 의연하였고, 대한 의사로서의 기개를 조금도 잃지 않았다. 대구, 경북 의병장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산남의진(山南義陣)을 이끌었던 영천 출신의 정환직(鄭煥直· 1843~1907), 정용기(鄭鏞基·1862~1907) 부자(父子)는 대구, 경북 의병 지도자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순국한 의병장이다. 정용기는 중추원의관으로 있던 부친 정환직의 뜻을 받들어 고향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전을 벌이던 중 1907년 10월 포항 죽장의 입암(立巖)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에 아버지 정환직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64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들을 대신해 산남의진을 지휘하였다. 하지만, 그도 역시 1907년 12월 순국하고 말았다. 의병전쟁에서 부자가 함께 순국한 드문 사례이다.
구미 임은리 출신의 저명한 의병장인 허위(許蔿·1854~1908)는 철원, 연천, 포천 등지를 무대로 활약하던 중 일제 헌병에게 체포되어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국하였다. 형 집행 직전, 왜승(倭僧)이 명복을 빌기 위해 독경하려 하자, 허위는 "물러가라,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것이거늘, 비록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왜놈의 독경소리는 듣기 싫다"라고 대성일갈하며 이를 물리쳤다. 의사의 드높은 기개를 짐작케 한다.
문경 가은 출신의 이강년(李康秊·1858~1908)은 중부지방을 석권하다시피 한 뛰어난 의병장이었다. 하지만, 연전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1908년 여름 청풍 까치성(鵲城) 전투에서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마치 촉나라 관우가 달이 지는 맥성(麥城)을 탈출하다 사로잡히고 마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부상으로 체포될 때 그는 다음의 비장한 시를 남겼다. "탄환이여, 참으로 무정하도다/ 발목을 다쳐 나갈 수가 없구나/ 만약 심장에 맞았더라면/ 욕보지 않고 저 세상에 갈 것을". 죽지 않고 사로잡혀 적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회한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도의와 명분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지사의 곧은 절개를 여기서 본다.
이강년은 서대문감옥에서 1908년 10월 13일 순국하였다. 그의 뒤를 바로 이어 허위가 순국하였으므로, 두 의사는 서대문감옥이 문을 연 직후에 잇따라 순국하는 진기한 기록을 남겼다.
영해 출신으로'일월산의 호랑이'로 불리며 경북 내륙에서 활동한 신돌석(申乭石·1878~1908)의 최후는 너무나 애처로웠다. 한미한 신분의 신돌석은 게릴라전으로 일제 군경과 혈전을 벌이던 중 탐욕에 눈이 먼 부하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일제에 매수된 부하들이 술과 고기를 권해 만취케 한 뒤 신돌석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처참한 순국은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간행되던 신문에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만인의 공분을 자아냈다.
의병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이러한 비극적 최후를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승패이둔불고(勝敗利鈍不顧)', 곧 이기고 지는 문제, 또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만 항일전에 투신해야만 하는 의리가 절대 우선이었기에 그 한몸을 장렬하게 불살랐다. 역사 해석으로 의역하자면 후세 자손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최후는 그러기에 의병장 안중근의 순국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거룩한 죽음'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박민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