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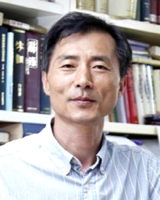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3심제가 우리에겐 익숙하다. 그런데 최근 3심 판결 불복 땐 헌재까지 갈 수 있는 4심제가 검토 중이라며 논란이다. 어느 쪽으로 논의되든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겠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하필 지금까지는 '3'일까. 또 이제부터는 '4'이어야만 할까. 차라리 한계를 무너뜨려 오, 육…십…백…무한으로 가면 되지 않나?
흔히 쓰는 말 중에 '삼세판'이 있다. '딱 세 번 겨루는 승부'를 말한다. '삼'과 '세'는 모두 '3'을 가리키는 겹말이다. 우리는 세 명의 심판, 세 번의 심사, 세 번의 기회 등 관습적으로 3을 선호한다. 그 원초적 심리는 무엇일까.
인류학자는 셋이라는 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유사 이전의 멀고 먼 옛날에는 하나, 둘, 셋이라는 아주 간단한 숫자조차 구체적인 실물을 빌려서 표현했다고 한다. 영국의 랜스롯 호그벤에 따르면, 대저 2만5천 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최초 인류가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양손의 도움을 빌려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켜서 일대일로 다른 물건과 교환해야 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한 손가락이 물건 한 가지를 대표하고, 세 손가락이 세 개를 대표하는 셈법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계산법이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은 셋보다도 많은 어떤 분량도 '하나의 무리'로만 간주하였다.
손가락과 실물의 대응 관계는 중국 고대 문자에서도 직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은 대의 갑골문에서는 1에서 4까지의 숫자는 손가락 모양으로 선을 하나, 둘, 셋, 넷씩 그었다. 초기의 수 개념은 추상적이 아니라, 헤아리는 실물의 숫자에 곧바로 대응하고 있었다.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원초적인 관념은 같은 글자 셋을 합성한 한자어에 잘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물이 많은 모양을 '묘'(淼), 나무가 많은 모양을 '삼'(森), 개가 떼 지어 달리는 것을 '표'(猋),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중'(众)이라 한다. 여기서 글자 셋은 3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여럿'을 뜻한다.
'초가집을 세 번 찾아가다'의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참다운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수도 없이' 성의 있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세 사람의 말이 호랑이를 만들어 낸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는 근거 없는 말을 '다수의 사람'이 말하게 되면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때의 3도 '많은, 여럿'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처럼 3이 '많은, 여럿'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류 사회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3을 넘어 '다수'로 가는 사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인류학자들의 원시 민족 연구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수를 세는 명칭이 '하나'와 '둘'밖에 없든가 가끔 '셋이 있기도 하다'고 한다. 미국의 수학자 조지 댄치그는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하나, 둘과 여럿 외에는 숫자가 없다"고 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뤼시앙 레비브륄도 말한다. "호주, 남미 등의 미개사회엔 하나, 둘, 드물게 셋까지밖에 셈말(數詞)이 없다. 그 이상이 되면 '여럿' '많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안다만 제도에서는 어휘는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셈말이라고 하면 '하나, 둘'밖에 없다. '셋'은 '하나가 더'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숫자가 둘을 넘어섰을 때, 원시인은 자주 '하나가 더'라거나 '몇 개가 더'라는 식으로 계산하거나, 숫자가 몇 개 더 불어난 경우엔 대개 '셋'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셋에는 '여럿, 많이, 엄청나게 많다' 혹은 '무한'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레비브륄은 말한다. "셋이라는 신비로운 숫자의 의미는 인류 사회가 수를 셀 때, 셋 이상 더 나갈 수 없었던 시대에 발단하여 '궁극의 숫자'거나 '절대 완전수'를 의미한다." 이같이 3은 훨씬 진보한 현대사회의 '무한'이라는 숫자와 유사한 특성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삼세판의 3에는 적어도 인류가 초기에 인식하고 있었던 궁극・최고의 숫자이거나 '여럿, 많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을 계속 지녀 오고 있다고 본다. 노자는 '3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했다. 3은 일단 하나의 완전한 사태의 종결이며, 여기서부터는 다시 다른 차원의 사태가 전개된다.
삼세판에서 그다음의 4를 말하지 않는 것은 '3'이 곧 '궁극/종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결론 없는 무한 반복이라는 혼란과 다툼을 끝내려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