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꾸꿈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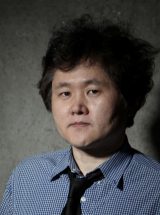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어릴 적, 잡초를 '지슴'이라 불렀다. 이름부터 어딘가 짐승처럼 느껴졌다.
요즘 정원을 가꾸다 보면 다시 그 지슴들과 마주한다. 질기고 얄밉고, 때로는 징그럽기까지 하다. 허리를 굽혀 뽑아도 며칠이면 다시 돋고, 비라도 한 번 내리면 거세게 솟아난다. 아무리 손질해도 끝이 없다. 지슴은 끊임없이 자라며 노동을 요구한다.
정원 가꾸기(gardening)는 흔히 여유롭고 고상한 취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자잘한 풀을 하나하나 뽑고, 가지를 치고, 마른 잎을 걷어내며, 흙을 다지고 물을 준다. 땀이 옷을 흠뻑 적시고, 무릎이 저리며, 온몸은 벌레와 가시에 긁힌 자국으로 얼룩진다. 그렇게 애써야 비로소 '나의 자연'이 만들어진다.
가드닝은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잡초는 인간의 통제를 비웃듯 자라고, 꽃은 예기치 않게 피며, 바람과 비는 모든 계획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 앞에서 인간은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반응할 뿐, 자연의 흐름과 리듬에 몸을 맡긴다. 노동의 반복은 지겨움이 아니라, 자연의 불규칙성과 공존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다.
손으로 자연을 다룬다는 건 지배가 아니라, 대화이자 적응이다.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은 오히려 낯설고, 조금은 위압적이다. 약간의 흐트러짐, 남겨진 풀 한 포기, 스쳐 간 새의 흔적들이 정원에 생기를 더한다. 가꾸는 사람은 그런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
정원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과 깊이 연결돼있었다.
동양의 정원은 자연을 빌리고 받아들이는 철학의 공간이었다. 인위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으며, 이끼 하나, 돌 하나에도 우주의 질서가 담기곤 했다. 반면 서양의 정원은 오랜 세월 동안 질서와 균형의 미학을 중시해 왔다. 기하학적 구성과 인간 중심의 조화를 통해 자연을 다듬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정원도 변하고 있다. 자연스러움과 생태적 다양성, 자율성과 회복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유의 흐름이 이동 중이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변해도,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결국 하나의 태도를 요구한다.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세계를 정돈해 나를 보여주는 일이다. 쉬울 리 없다. 몸은 낮춰야 하고, 반복되는 노동은 쉼 없이 계속된다. 잡초는 끈질기고, 피고 지는 꽃은 무심하다. 그러나 그런 시간 끝에 조용한 기쁨이 피어난다. 가드닝은 자연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보려는 의지다. 아름다움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노동의 시간 위에 놓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