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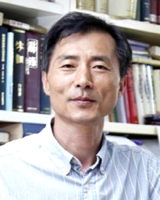
몇 년 전 유행했던 게 다시 생각났다. 3광 1무 1유.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가 없으며, 한 가지가 있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한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이란다. 좀 냉소적이나 적절한 지적이다. 즉 한국인은 스마트폰, 공짜 돈, 트로트에 미쳐 있고, 생각은 없으며, 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논란되는 게 '공짜 돈'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서 지난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원금을 주겠다 한다. 소비 진작의 한 대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빚도 탕감해 준단다.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시적인 돈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 같은 제도 마련이 급선무이지만 급한 불부터 꺼보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언 발에 오줌 누기'(凍足放尿)다. 잠깐의 효력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상황 개선은 어려울 듯하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양잿물은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라 하면 대개 아무 생각 없이 '독'이 있든 말든 마신다는 말이다.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데, 어려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안 받을 사람은 없다.
사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공짜는 다 독을 안고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갚아야만 한다. 지금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료라는 이름의 상품들이 대개 그렇듯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그 독에 중독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의도-기획'에 잡아먹히게 된다.
흔히 쓰는 말 "뭔가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상품이다"를 곱씹어본다. 처음엔 무료 앱인데 결국 그 미끼에 낚여 개인정보가 털려 나가 자신이 앱의 상품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득 되는 일을 보면, 그것이 옳은지 어떤지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옳다.
'전국민 지원금'이 순수한 복지만의 문제일까. 설마 정치적 이득이 고려된, 새콤달콤한 상품은 아닐지. 눈앞의 이득이 전부는 아니다. 공짜 돈을 푸는 정치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도덕과 철학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만났다. 왕이 말했다. "견식이 높은 어르신께서 이렇게 먼 길을, (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 주셨는데, 어디 그대의 말씀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그려. 그대의 철학대로 라면, 우리나라에 어디 실질적 이득이 있을지요?" 그러자 좀 성질이 난 맹자가 한 마디 내뱉는다.
"왕의 위치에 있는 분이 어째서 반드시 눈앞의 '이득'만 따지고 야단인지요? 나라를 다스림에 당장의 이득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仁)과 의(義)' 같은,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 가져야 할 도덕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득만 따져대는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맹자는 정치를 잘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득'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가치도 신중하게, 균형감 있게, 잘 챙기라고 닦달한다. 그렇다. 공동체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휴머니티[인]와 아울러 공동체의 보편 룰[의]을 소홀히 하면, 정작 챙기려는 이득마저 한순간 잃고 만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된다.
나아가 맹자는 공짜에 빌붙는 마음을 꾸짖었을 것이다. 공짜는 어딘가에 '의존하고 기대는' 마음을 키워 타력적, 수동적 인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성선설은 자력적, 독립적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도자는 인민의 자율, 자력, 자존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하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를 누가 원하는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고,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를 누가 바라는가.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도움 받기를 좋아하는 몰주체적 성향을 흔히 '거지 근성'이라 한다. 나라가 다 해주는데, 왜 돈 벌어야 하며, 왜 공부해야 하며, 왜 취업해야 하는가. 무료, 공짜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족하다. 늘어나는 무료, 공짜의 정치가 사회의 성숙이 아니라 미숙을 심화시킨다면, 진보가 아닌 퇴보의 방책이다.
동학에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유]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무]을 서로 도우라[상자]는 것이다. 부유의 과실을 나누고 재분배하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기반으로 연대한 자력의 공동체를 뜻한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김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 하늘의 성실함을 닮아가려는 경건한 라이프스타일에는 남에게 빌붙는 근성이 없다. 자율과 자존감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이기에, 어느 자리에서건 하늘 같은 주인으로 우뚝 서려 한다.
국가가 궁여지책으로 어려움에 개입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도, 어느 땅에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고 말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민심을 지속적 제도적으로 보살피는 정치적 안목의 수준이다. 자칫 선심성 공짜 바이러스가 스스로 살아내려는 민생의 자생력을 허물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