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사와 기요시, 21세기의 영화를 말하다'
구로사와 기요시 지음 / 미디어버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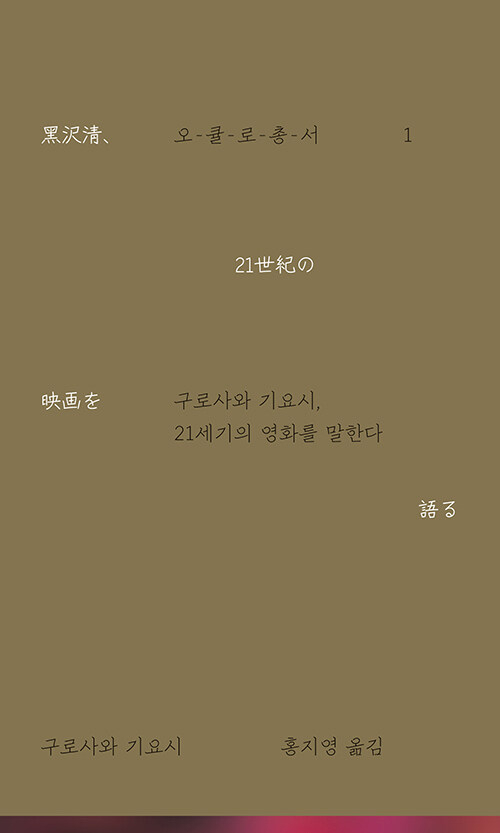
하스미 시게이코에게서 영화를 배운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는 일본 영화감독 중에서도 시네필로 정평이 난 사람이다. 릿교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놓은 적 없고 영화로 생각하고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주저함 없는 그가 책을 냈다.
'구로사와 기요시, 21세기의 영화를 말하다'. 책 제목이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뒷면부터 펼쳤다. 출판사 대표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한 영화평론가 유운성이다. 유운성의 평소 글과 영화관을 고려할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은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저자의 12회 강연을 담았다. 그는 글보다 말, 말보다 현장에 더 강하다. 그러니 구로사와의 영화 세계를 글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 구어체를 고스란히 살린 건 이 때문일 것이다.
책에서 구로사와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그리기 위한 기술"이라고 영화를 정의한다. 허우샤오시엔도 말했다. 어떤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그 감독이 그리는 세상을 좋아하는 거라고. 또 저자는 카메라의 목적은 "눈앞의 사물이 발하는 빛을 그저 물리적으로 네모나게 오려내는"거라고, 창조와 창작이 아닌, 펜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단지 오려내는 거란 얘기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할 말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다. 구로사와는 오즈 야스지로 영화를 거론하며 인상적인 쇼트를 말하는데 '바람 속의 암탉'의 엔딩. 즉 전후 일본이 새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소멸이 담겼고 이를 기점으로 밝고 따뜻한 오즈 특유의 미장센이 탄생한다는 주장은 과연 그 스승에 그 제자라 할만하다.
오즈의 도쿄가 가진 공간성에 대한 강의는 특별히 흥미롭다. 영화를 찍는 것은 그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는 행위라면서 로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역설할 때, 나는 구로사와 영화 중 첫손에 꼽는 '도쿄 소나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영화감독의 역할에 대해 구로사와는 "유연한 배려를 통해 촬영 현장의 자잘한 혼란이나 각본가와의 대립 등을 천연덕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밝힌다. 16mm 단편영화라도 찍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하고도 남으리라.
'백 투 더 퓨처'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스케이트보드로 트럭 꽁무니에 매달려 사라지는 쇼트와 '죠스' 오프닝의 바다로 뛰어드는 여성의 전라 신이 펼쳐지는 마법의 순간을 감독의 일로 규정할 때, '폭력의 역사'에서 비고 모텐슨의 머리카락이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화 '도쿄 소나타'의 가족 식사 장면으로 나아갈 때면 구로사와가 품은 영화에 대한 집념과 애정에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한 때 영화광이었던 영화감독이 바라보는 영화와 영화판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감회를 쉬운 용어로 풀어냈다는 점은 편집자의 고민과 수고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강연을 풀어쓰다 보니 구어체 문장이 많지만, 외려 현장감 넘치는 흐름으로 텍스트를 현재화시킨다.
21세기의 영화는 오려내는 행위가 지속 될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하는 구로사와 기요시. 쇼트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영화 본질을 거론하는 사람조차 보기 힘든 시대에 21세기의 영화는 어떤 것인가, 혹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염려하는 거장의 목소리가 신선하다. 그럼에도 공은 전적으로 편집자에게 돌려야 맞다.
영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