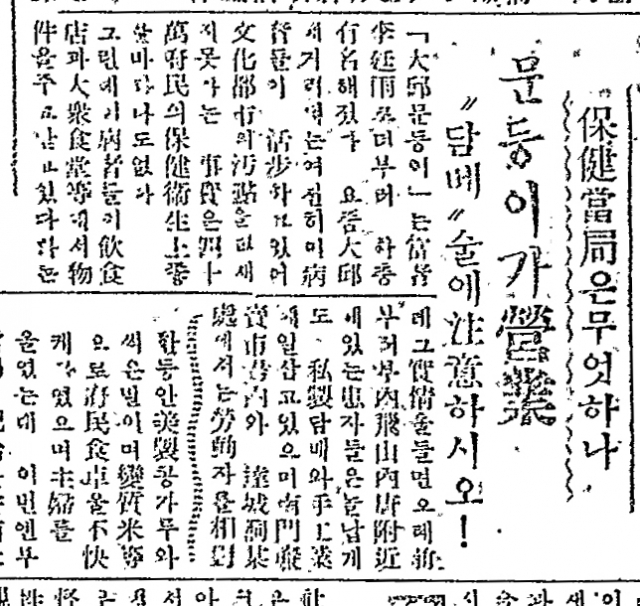
'대구 문둥이는 부자 이정우와 더불어 한층 유명해졌다. 요즘 대구 거리에는 여전히 이 병자들이 활보하고 있어 문화도시의 오점을 남긴 사실은 40만 부민의 보건위생상 좋을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음식점과 대중식당 등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있다 하는데 그 실정을 들면 오래전부터 부내 비산 내점 부근에 있는 환자들은 놀랍게도 사제담배와 수공업에 일삼고 있으며 남문 염매시장 내와 달성동 모처에서는 노동자를 상대로 잡화 혹은 주류와 음식을 팔고 있어~.' (매일신문 전신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29일 자)
1955년 가을, 대구 내당동의 가정집에서 잠자던 9살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부모는 수양딸인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다. 해를 넘겨도 집을 떠난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났다. 무슨 말 같잖은 소리냐고. 그때는 그랬다. 아이를 잡아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예사로이 떠돌아다녔다. 그 말대로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아이에게 호강시켜 주겠다고 꼬드긴 뒤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나병 환자에게 말이다.
'대구 문둥이는 부자 이정우와 더불어 한층 유명해졌다'는 무슨 말일까. 이정우는 대구에서 이름난 문둥이 부자였다. 문둥이에게 좋다는 가짜 약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 약에는 아이를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도 포함됐다. 아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을 악용해 큰돈을 벌었다. 단속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덮으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당시 나병환자는 상대적으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에 많았다. 과거에는 좋든 싫든 지역에서 숫자가 많거나 두드러지면 명물이라는 말을 곧잘 붙였다. 대구 명물 사과나 대구 명물 더위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명물 문둥이로 부른 이유였다. 나병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했던 이정우는 대구에서 악명이 높았다.
나병 또는 한센병을 낮잡아 부르는 문둥병은 다른 전염병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아야 할 질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난치병인데다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려워 하늘이 내린 병(天刑)으로 여겨졌다. 이러다 보니 나병은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주민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환자들이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공포로 다가왔다. 나병환자가 비산동에서 술과 담배를 팔고 염매시장에서 잡화점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당국에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난리가 났다. 술집과 가게의 특성상 동네 주민들이 쉽게 나병에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나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슈였다. 1917년 대구에서도 나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들어섰다. 병원의 설립과는 상관없이 나병환자에 대한 혐오와 기피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게다가 아이의 간을 꺼내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는 좀체 사그라지지 않았다. 몸이 아프면 굿을 하듯 미신에 불과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 나병환자들에 대한 공포와 기피는 더욱 심해졌다. 일상생활이 막히자 나병 환자들은 문전걸식하거나 떠돌이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나병환자들이 동네를 떠돌다 보니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동인동에서 신암동으로 통하는 철교 밑에는 나병환자들이 약 30여 세대를 이루며 살았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자 신암과 범물 일대의 감자와 고구마 등 농작물과 채소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았다. 게다가 밤중에는 다리 위를 건너는 부녀자를 위협하는 일까지 생겼다.
길 가는 아이가 나병환자들에 잡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출됐다는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동굴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아이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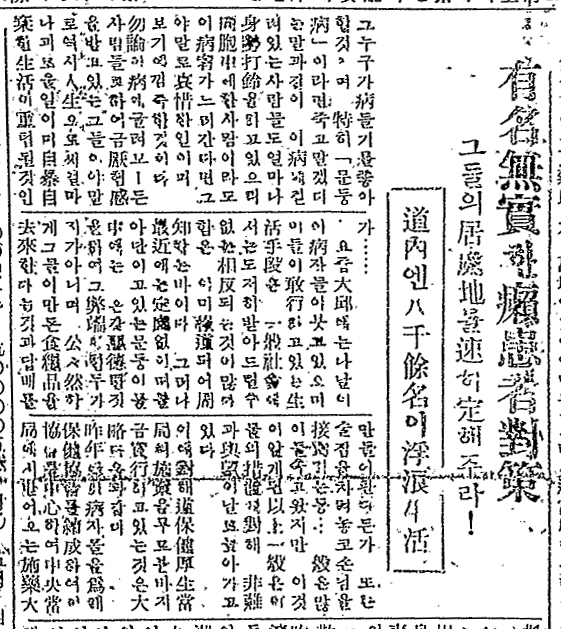
'그 누구가 병들기를 좋아할 것이며 특히 문둥병이라면 죽고 말겠다는 말과 같이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세타령을 하고 있으리. 동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병자가 늘어간다면 그야말로 애석한 일이며 보기에 끔찍한 것이다.~' (남선경제신문 1948년 9월 2일 자)
나병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향한 관심은 점점 높아졌다. 대구에서는 보건협회를 만들어 나병약인 대풍자유 등을 대구와 영천, 고령, 성주, 안동, 의성, 김천, 왜관 등에 분배했다.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정착촌 설립에도 나섰다. 영천군 금호면 산중에 1천900평 규모의 터를 잡았다. 산중임에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 부근에 천막촌을 만들었다. 나병환자에 대한 기피의 시선이 옅어지지 않았던 탓이다.
나병환자는 왜 문둥이가 됐을까. '못난이'에서 유래됐다는 옛 기사를 볼 수 있다. 나병환자를 낮춰 부르며 문둥이가 됐고, 보리밭에 숨어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설화 같은 이야기는 보리 문둥이가 됐을 법하다. 하지만 못난이의 문둥이는 나병환자들이 결코 아니다. 막무가내 외곬 문둥이가 못난이다. 그런 '보리 문디' 말이다.

(톡톡지역문화연구소장‧언론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