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잘나가던 기자, 낯선 땅 노동 전전하다 삶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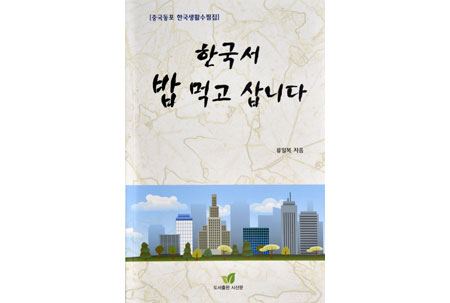
한국서 밥 먹고 삽니다
류일복 지음/도서출판 시산문 펴냄/ 241쪽, 1만2천원.
중국 동포 류일복(45) 씨가 6년간의 한국 생활을 담은 수필집을 냈다. 2010년 3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부터 시작해 고무공장, 재활용품회사, 식품공장, 콘크리트회사 등 3D 업종을 전전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게 담았다. 또 가족이 살고 있는 중국 칭다오로 설 쇠러 갈 때의 설레는 마음과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도 실었다. 류 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체험을 글로 녹여내는 한편 우리말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로 휴일이면 도서관을 찾는 일상을 반복했다. 류 씨는 "중국에서 기자 생활로 잘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울타리에 지나지 않았고, 가장 밑바닥인 한국 직장생활의 체험을 통해 노동의 단맛과 쓴맛, 인간관계를 배웠다"고 말했다. 류 씨는 "열심히 살면서 다음에는 더 나은 수필집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하나?
▶나는 행운아다. 왜냐하면 학력도, 인맥도, 돈도 없는 나에게 한국으로 올 행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변방 농촌청년이 방송국 기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 생활도 비교적 평탄했다. 아산에 있을 때 사장은 명절 때면 갈 곳 없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줬다. 안동에서도 공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이 참 인간적이었다. 경영이 힘들었는데도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 설'추석 때는 보너스도 챙겨줬다. 한국에 와서 노동일이 몸에 배면서 책상물림보다는 노동이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앉은뱅이 책상머리보다 노동 현장이라는 사회 교실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는 진풍경들이 더 다채롭고 풍부했다. 그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문학으로 연결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짧은 인생에 밍밍한 탄탄대로보다 굴곡적인 것이 더 세상을 살 만하게 했다. 낮에는 일하면서 사색하고 밤에는 한 편 또 한 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등 땀 흘리고 나서 등목한 후 느끼는 가뿐한 기분처럼 행복했다.
-고향 문우(文友)에 대해?
▶어릴 적 고향에서 문학모임을 했는데 5, 6명이 매달 한두 번꼴로 만났다. 회비고 뭐고 관두고 오늘은 관이네 집, 다음은 란이네 집, 그다음은 봉이네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그 집 있는 그대로의 살림 풍경을 보여주고 맛내기도 했다. 누룽지를 와드득 씹어 먹고 잣과 개암, 해바라기씨도 까먹고, 푹 익힌 강낭콩 볶음채와 짭조름한 감자채를 안주로 소주잔을 기울였다. 란이네 집에서는 귀한 친구들이 왔다며 아껴 키우던 닭 모가지를 비틀었다. 모임 뒤에는 술상을 벌이고 물린 뒤에 트럼프치기도 하는 등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여자들은 거실에, 남자들은 윗방에 미닫이를 향해 머리들을 향하고 누웠다. 피 끓는 젊음들이었지만 시골의 순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도색적인 언사는 한마디도 던지지 않았다. 그것보다 도란도란 문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래가 실린 이상에 대해서 끝없이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주고받다 보니 날이 훤히 샜다. 그리고 살길을 향해 뿔뿔이 헤어졌다. 그때 모임 친구들 가운데 절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2년 전 여름부터 연락이 닿았다. 카톡으로 서로 연락한다. 식탁의 고향 흰 술이 도수 낮은 소주로, 개울가에서 부르던 연변 노래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한국 발라드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로 변신한 듯하면서도 변신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활이 좋아졌지만 어릴 적 기억과 추억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혹독해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새삼 놀라웠다. 그것이 우리를 끈끈히 묶는 것 같다. 요즘 문우들과 가끔 만난다. 다들 일이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 옛날이야기도 하고 한국 생활, 문학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한국에서 해후한 소중한 내 단짝 같은 문우들이 바로 오늘도 쌀독을 박박 긁어 인심 나오는 산타클로스다. 오늘도 그들이 그립다.
-한국말에 대해.
▶어릴 적 북한 말을 배웠다. 남한 말은 북한 말에 비해 부드럽다. 우리말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표현하는 데도 더없이 좋다. 요즘도 단어나 글, 표현 등 아름답고 좋은 말을 저장해놓았다가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이나 글을 두고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나는 요즘도 도서관에서, TV를 통해 우리말을 배운다.
-가족이 있는 칭다오에 자주 가나?
▶칭다오에는 아내와 열 살 된 딸아이가 있다. 최근에는 번 돈으로 집도 샀다. 그래서 명절이면 간다. 칭다오에 가면 큰 숨을 쉬면서 긴장이 풀린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고 쓰레기 분류도 안 해도 되는 등 자유롭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 던져지는 중국의 플라스틱류 쓰레기가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뉴스를 보고 얼굴이 화끈해진다. 한국에 산다고 한국화한 것이 아닌 걸 보면 나는 확실히 중국 사람인 모양이다. 요즘 중국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숨이 막히지 않는 것이 많다. 품질은 차이 나지만 그래도 음식값이 비싸지 않고 넉넉하다. 하루 놀고 먹으면 곱빼기로 벌어야 하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지낼 때만큼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쇼핑하러 부리나케 돌아다닌다. 한국에 일터가 있고 중국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서 기계가 작동하듯 낯섦과 낯익음의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요즘은 딸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기차에 대한 기억과 향수가 많은 것 같은데?
▶내 꿈은 할아버지의 고향인 이남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북으로 가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으며 집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고 싶다. 두만강을 건너 고향인 옌볜에 이르면 시원하게 아리랑 가락을 뽑으며 덩실덩실 도라지 춤을 출 것 같다. 저렇게 방치된 비무장지대가 아닌 휴전선의 철망을 싹 걷어내고 질풍같이 기차를 타고 내달리고 싶다. 고향 가는 길도 편해 좋고 생경한 사투리가 섞인 우리말로 우리 민족끼리 교감하는 기차여행은 더 정겹고 행복할 것 같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기차로 평양을 거쳐 두만강 건너 고향으로 갔으면 한다. 북한 동포를 만나고, 우리 땅을 밟고 가면 얼마나 좋으냐.
-앞으로 계획은?
이번 책을 내는 데 6년이 걸렸다. 그러나 자신감도 생겼다. 신춘문예도 응모해보고 싶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다. 수필 쓰면서 두 번째 책을 계획하고 있다.
◇류일복은?
저자 류일복(필명 류성, 별똥별)은 1971년 6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의 두만강변 오지마을에서 태어났다. 길림성 화룡방송국 편집기자, 신문사 기자 하다 2010년 한국에 왔다. 현재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국 연변일보 CJ 문학상 본상, 제5회 황순원사이버백일장 대상, 제21회 경기도노동문화예술제 금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