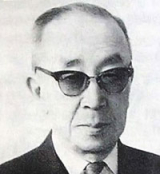
일반적으로 독자는 소설의 작가는 기억하지만, 번역자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작품이라도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진다. 고인(故人)이 된 이윤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번역자면서, 동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전문가였다. 그래서 그의 번역은 이해하기 쉬웠고 독자들은 그의 번역을 좋아했으며 번역가 이윤기를 기억했다.
식민지 시기에도 드물기는 했지만 전문번역가가 있었다. 서구 외국의 경험이 많지 않은 조선의 상황에서 서양 서적 전문번역가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 최초의 해외 특파원이자, 언론인으로 유명했던 김동성(金東成)은 식민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서양문학 번역가 중 한 사람이었다. 김동성은 190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0여 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 생활 속에서 삽화를 곁들인 에세이집 '동양인의 미국 인상'(Oriental Impression in America'1916)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랫동안의 미국 유학 경험, 게다가 미국에서 영어 에세이집까지 출판하였으니 영어에 관한 한 김동성을 따를 자가 조선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언어가 새로운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이 권력으로 연결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필명을 '천리구'(千里駒), 즉 '뛰어나게 잘난 자손'이라고 붙인 것에서 김동성의 자신감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귀국 이후 김동성은 동아일보 취직과 더불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다섯 편을 뽑아 '붉은실'(192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연재 이전부터 김동성의 번역이며 조선 최초의 직역(直譯)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다. 이제는 조선도 일본에서 벗어나 서양 서적을 조선 자체의 힘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감격이 이 광고 속에 들어 있었다.
모든 상황은 절묘하게 들어맞는 듯 보였다.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건과 사고를 전달하는 신문기사의 특징! 치밀한 구성을 통해 허구의 사건 속으로 독자를 이끄는 추리소설의 특징! 이 둘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많았다. 아울러 김동성은 영어 해독 능력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문화에 대한 감각까지 갖추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동성은 논리적 추론과 세밀한 묘사로 구성된 셜록 홈즈의 원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 즉 직역을 포기한다. 그 대신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대충 조합한 '축약된 번역'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1920년대 조선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는 참으로 멀었다. 거기에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문화적 거리 역시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 대중은 긴 묘사의 지루함을 견디고, 추리소설의 논리적 추론 과정을 즐길 만한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일본을 포함한 세계는 '마더' 같은 우리 영화에 내재된 추리적 기법의 우수한 특질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국내 서점 진열 칸을 채우던 일본과 서양 작가의 번역판 추리소설을 뒤로 제치고 우리 작가들이 쓴 추리소설이 그 자리를 채울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정혜영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