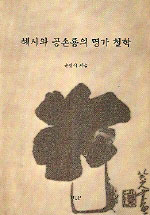
이번에는 어떤 고전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파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손룡자', '장자', '묵자' 등에 가끔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일반 독자들이 그것을 일부러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 이 학파의 성격이 중국 한자의 특성, 그에 말미암은 사고방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논리와 추상적 사고의 추구는 동서양 공통이다.
아쉽게도 이 명가의 논리가 제대로 이론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궤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러한 점이 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자로 쓰여진 중국 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명'(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름' 내지 '개념'을 말하는데, 명가는 이 이름과 '실'(實), 즉 사실이나 개념의 실질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난 명칭이다. '일치 여부'는 오늘날 말하는 '논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논리학파'라고 쓰기도 하는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고대 자기 학파의 선전과 다른 학파와의 논쟁을 위해서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혜시(惠施, B.C 360∼310년)는 장자와 동시대인으로 그의 친구였다. 그의 글은 없어지고, 일부 '장자'(천하편)에 남아 있는데, 장자의 사물인식 방법, 즉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하늘은 땅과 같이 낮고, 산은 못과 같이 평평하다", 또는 "중천에 떠 있는 해는 동시에 저물고 있는 해이고, 살아 있는 만물은 동시에 죽어가는 만물이다", 또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등으로 말한다. 이는 사물 인식의 상대성을 말하려는 표현이다.
공손룡(公孫龍, B.C 320∼250년)의 말은 '공손룡자'에 6편이 남아있는데, 그의 학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편자', 또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 여기서 '희다'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만약 '단단하고 흰 돌'이 여기 있다고 하자. 공손룡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 '단단함'과 '희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단하고 흰 돌이 있는데, 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단단함', '희다'와 같은 보편자, 즉 '이데아'를 그는 말하고자 함이다. 한문은 굴절어가 아니므로 보통명사와 추상명사를 구분할 수 없다. 문법도 한자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단어에는 고정된 품사가 없다. 사태를 즉물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공손룡이 추상세계를 말하려고 했으나, 한문으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이동희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 dhl333@k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