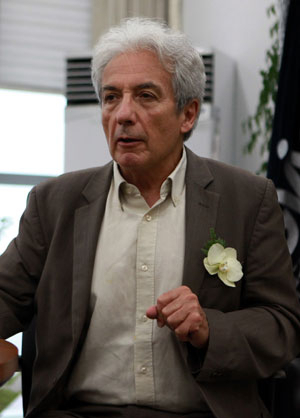



아직 국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벨상은 여전히 멀고, 높아 보인다. 노벨상은 실현될 수 없는 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는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3명을 초청했다.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페르(Albert Fert, 파리11대학 교수)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Andre Geim,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 199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에르빈 네어(Erwin Neher, 독일 막스플랑크 명예소장) 등이다. DGIST 신성철 총장은 이들과 함께 국내 과학 연구 분야의 숙제와 노벨상 수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DGIST의 전략과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또 과학 연구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려면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이 이들과 나눈 대화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DGIST의 비전과 전략 인상적
신성철(이하 신): 한국, 그리고 DGIST에 온 느낌과 소감이 어떤가?
알레르 페르(이하 페르) : 국제자성학회(ICM) 참석차 한국에 왔는데 DGIST는 신생기관이지만 비전과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다.
안드레 가임(이하 가임) :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지원이 좋은 것 같다. DGIST는 해내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에르빈 네어(이하 네어) :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로 와서 보니 많은 과학 리더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DGIST도 마찬가지다.
◆독창성과 인내가 노벨상 수상의 길
신: 한국은 아직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향후 10년 안에는 한국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가임: 연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인내와 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지속한다면 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들의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
페르: 좋은 교육과 함께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믿고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한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틀에 얽매이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네어: 자신만의 생각과 질문을 갖고 연구에 몰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나 교수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순위를 매기는 시험을 최소화하고 학교나 학과의 순위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필요 없는 곳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기초 과학 분야의 투자 중요
신: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임: 정부는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기다려야 한다. 한국도 정부 지원이 지금보다 더 진행된다면 향후 10~15년 내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낼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삼성과 LG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그래핀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부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학자들에게 안정된 연구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페르: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은 자유로운 탐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연구자들은 자신의 틀에 갇혀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의 지원과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DGIST의 뇌과학 분야 고무적
신: DGIST는 뇌 과학 분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뇌 과학의 중요성은?
네어 : 21세기 첫 노벨 생리의학상은 뇌 연구에 공헌이 큰 애비드 칼슨(Arvid Carlsson)과 폴 그린가드(Paul Greengard), 에릭 캔델(Eric Kandel) 등에게 수여됐다. 이는 21세기에는 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뇌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세포의 집합체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뇌'라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뇌 연구를 위해서는 생체물리, 생화학, 인지 등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적인 이해가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신: DGIST 뇌 과학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네어: DGIST의 뇌 과학 교육과정은 막스프랑크 연구소와 유사하다. 독일의 박사과정 시스템은 최고를 위한 교육이지만 미국은 대중적인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런 점에서 DGIST의 교육철학은 독일의 시스템과 공통점이 있다. 학생 선발을 위한 1박 2일 동안의 심층면접과 개인 연구능력 검증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뇌 과학 기초 지식의 강화를 위한 필수 과목 운영과 응용 및 확대를 위한 선택과목 개설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본다.
◆기초과학 중시하고 열정 잃지 말아야
신: DGIST를 포함한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가임: 한국 내 어디에선가 노벨상에 근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한국에서 분명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구자는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인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페르: 과학 분야의 발명과 발견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연구해야 할 많은 분야가 산적해 있다. 그래서 과학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어: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초과학을 중시하면서 멀리 본다면 근면하고 영리한 한국인들은 세계 과학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신: 21세기의 발명과 발견은 학문의 접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DGIST의 융복합 연구는 그 접점의 연구를 하기 위한 분야다. 학생과 교수, 연구원들에게 노벨상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DGIST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염원인 과학기술분야 첫 노벨상 수상자를 DGIST에서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간 '비슬노벨가든'을 조성해놓고 있다. 분명 DGIST에서 미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것으로 믿는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