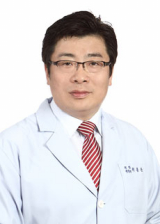
옛날에 우산장수 아들과 부채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은 부채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걱정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걱정했다는 얘기다.
요즘 신용카드사나 정부가 이 어머니의 입장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사는 우화 속의 어머니와 입장만 같을 뿐 그 반응은 전혀 달랐다.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2.7%라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중소 자영업자들과 정부의 요구에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놀이공원 및 극장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 이용 실적 기준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등 서비스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제 숨을 돌릴 만하자 소비자들이 그 역풍을 맞은 셈이다.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없으니 그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떠안기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구조였다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1978년 신용카드사가 생겨났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쓸 곳도 없었다. 그때 정부가 나섰다. 1987년 신용카드업법을 제정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고, 2000년대 초에는 처벌 조항까지 추가해 신용카드 대중화에 앞장섰다.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라는 혜택도 안겨줬다. 당시 신용카드사들은 호황을 맞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무차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이로 인한 대란을 맞기도 했다.
고비를 넘긴 신용카드사들은 보다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앞다투어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각종 할인제, 포인트제 등을 내세우며 회원 확대에 열을 올렸다. 성인이 된 국민 한 사람당 카드 한두 개는 기본인 사회를 그들이 만들었다. 정부는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며 그들을 도왔고, 국민들은 물건값을 외상으로 사는 달콤함에, 각종 할인 혜택이라는 우월감에 들떠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다. 신용카드사들은 거대할 대로 거대해졌고, 국민들은 신용카드 없이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중소 가맹점에 이어 소비자들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불만을 들어주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그 불만을 떠넘기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오늘을 만든 정부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인 중소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사들도, 소비자들도 모두가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자식이다. 어느 자식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겠느냐마는, 부모 역시 공정해야 한다. 똑똑한 자식 하나 대학 보내자고 다른 자식이 희생이 되었다면 희생된 자식을 위해 부모는 또 다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소비자들은 피자 한 판에 정가가 2만3천원이라도 20% 할인된 1만8천400원에 늘 사먹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격은 지금까지 1만8천400원이었지만 이제 2만3천원을 내야 한다.
(구미 탑정형외과연합의원 원장)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