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함께하는 식탁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진정 어린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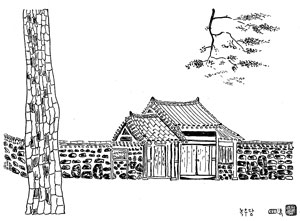
꽃은 먹어서 배부른 음식은 아니다. 그러나 꽃은 음식 맛을 부추기는 향료나 고명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걸 공연 예술에 대입하면 백 댄스나 배경음악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허브 식물의 꽃잎 즉 비올라, 나스터튬, 임파첸스 등을 밥 위에 얹어 꽃 밥을 만들어 먹는 걸 보면 이젠 꽃도 음식 반열에 오른 것 같다.
꽃을 급수로 따지면 밥이나 향보다는 몇 수 정도 높은 것 같다. 신라 향가에 나오는 헌화가를 보면 산중 늙은이가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에게 절벽 위의 꽃을 꺾어 바치는 장면이 나온다.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하필이면 왜 꽃을 꺾어 마음을 표시했을까.
송강의 장진주사에도 꽃 이야기가 나온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산(算)노코 무진무진(無盡無盡) 먹세그려. 이몸 주근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혀 묶여가나 떡갈나무와 백양나무 숲에 가기만 곧 가면 누런해 흰달 가는비 함박눈 소소리바람 불제 뉘 한잔 먹자할꼬." 노인의 정표였던 꽃이 시대가 바뀌면서 술자리의 주판으로 둔갑하여 술 한 잔이 꽃잎 하나로 계산된다.
그러다가 근세로 접어들면 꽃은 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로 이미지가 바뀐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김춘수의 시 '꽃')
여자의 변신은 무죄이듯 꽃의 변신도 무죄인가. 여행 도반들은 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르다. 바닷가 여행 중에 길거리 식탁을 차리더라도 꽃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생선회를 뜨는 와중에 쑥부쟁이나 개망초라도 한 송이 꺾어와 소주병에 꽂아야 비로소 주회(酒會)가 시작된다. 꽃과 함께하는 식탁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풍류지만 그건 어쩌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진정 어린 기도가 아닐까.
도반들은 꽃에 대한 정성도 지극하지만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존심(尊心)이 곧 자존(自尊)임을 안다. 가령 자동차 한 대에 네 사람이 타고 여행을 떠날 경우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의 직함을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운전하는 이는 기장, 옆자리 앉은 이는 부기장(별명'내비게이션), 뒷자리에 앉은 이는 사무장과 스튜어디스라 부른다.
차를 항공기로 격상시키고 보니 도반들 모두가 근사한 승무원 직책을 얻게 된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늙은 아이들도 때론 '동화 속의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일이다.
거제도 남부면 어느 정자나무 그늘에선 코스모스로 곧 신부 입장이 있을 식장처럼 장식하고 멋진 '풀밭 위의 식사'를 즐긴 적도 있다. 또 장승포 선착장에선 고기상자 식탁을 인근 텃밭 꽃들로 치장한 후 생선회를 뜨고 있으니 지나가던 어부들이 "회는 제대로 잡수실 줄 아시네요" 하고 축원해 주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 말에 취해서 멀미가 나고/ 꽃들을 너무 많이 대하면/ 향기에 취해서 멀미가 나지/ 너무 많아도 싫지 않은 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도 꽃처럼/ 향기가 있다는 걸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지."(이해인의 시 '꽃 멀미')
꽃 멀미 속에 사람 향기나 맡으며 그저 외롭지 않게 황혼을 맞았으면.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