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꾸꿈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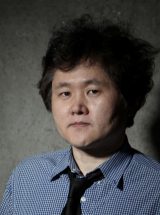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전시장과 작업실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참고해 작업의 방향을 가늠하고, 전시 기획서나 문안을 다듬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검토하는 일은 이제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이미 AI는 많은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작업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새 일부가 됐다. 누군가 선언하지 않아도 기술의 진입은 이처럼 일상적인데, 이를 둘러싼 논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장면은 반복됐다. 19세기 초반, 그림이 유일한 기록 수단이던 시절 사진의 등장은 예술의 역할을 바꿨고, 20세기 말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은 관점과 표현 방식을 다시 한번 재편했다. 그럼에도 예술 현장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우려와 책임이라는 추상적 언어에 머문다.
체스와 바둑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1997년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으며 인간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줬다. 바둑 역시 AI 앞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 없는 영역이 됐지만, 게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프로기사들은 AI의 수를 분석하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략과 미학, 즉 인간만이 감지할 수 있는 '선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인간은 승자의 자리에서 해석자의 자리로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AI는 이미지 생성과 음악 작곡을 수행한다. 그러나 무엇을 질문할지, 어떤 맥락에서 보여줄지, 왜 지금, 이 작업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작업 현장에서 만나는 작가들은 인간과 AI가 생산한 결과물 사이의 의미를 탐색하며, 동시에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도 실험하고 있다.
이 변화는 인간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패배를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AI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묻지는 않는다. 결국 인간의 고유성은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에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다.
지금 예술 현장에 놓인 것은 외면이나 체념이 아니라 결정이다. AI를 원용한 실험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아낌없는 공유다. 예술은 기술의 속도보다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 예술의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시선과 판단, 그리고 윤리에 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구를 만들 것인가. 선택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