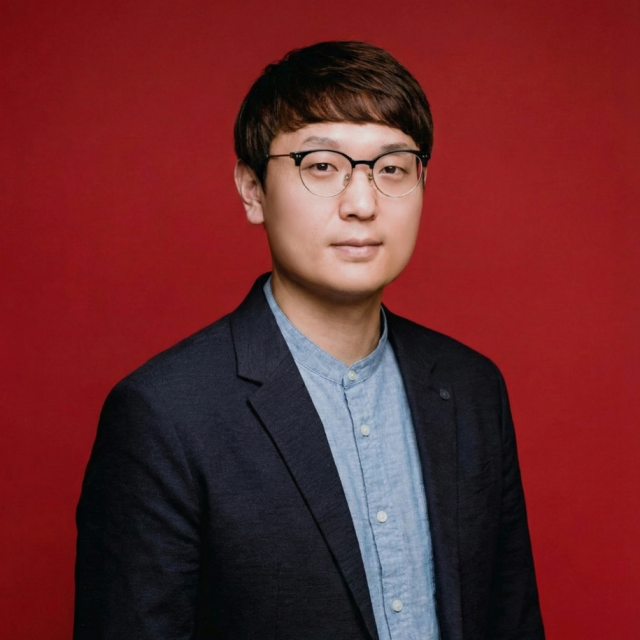일본 롯데리아가 폐점을 하면서 영수증에 남긴 메시지가 화제다.
'그 시절 추억 속에 이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년 간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 영수증을 보며 한 가지의 질문과 다른 한 가지의 감탄이 들었다.
질문은 '왜 영수증에 이런 메시지를 썼을까?'였고
감탄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는 역시 다르구나'였다.
그렇다. 한 가지의 질문과 감탄은 사실 둘 다 감탄이었다.
이 영수증을 보며 나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브랜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브랜드, 광고, 마케팅 사례를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각 나라의 브랜드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다. 결국 브랜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브랜드의 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섬세함이다. 일본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매우 섬세하다.
저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노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롯데리아의 선택은 작디작은 영수증이었다.
어떤 손님은 받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손님들이 받더라도 그냥 버리는 영수증을 택한 것이다.
섬세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시절 추억 속에 이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스펙을 말하고 있지 않다.
지난 37년 동안 팔았던 햄버거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지난 37년 동안 다녀간 손님의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숫자라는 이성을 버리고 대신 '추억'이라는 감성을 말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지만 인간을 상상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니 마음을 터치할 수 없다.
반면, 추억은 사람을 상상하게 만든다.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고 향기를 남기고 그리워하게 만든다.
좋은 브랜드는 물러날 때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물리적인 스펙은 사라지더라도 그저 향기를 남긴다.
사람들은 그 브랜드가 남긴 마지막 향기로 그들을 기억한다.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좋은 브랜드로 남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