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꾸꿈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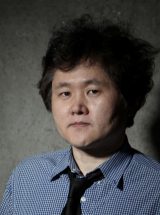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머그잔 하나를 찾았다. 손잡이에 실금이 가 있고, 바닥엔 커피 얼룩이 옅게 배어 있었다. 흐릿한 로고와 손에 익은 감촉까지, 세월이 남긴 자취가 또렷했다. 더는 쓰지 않지만 선뜻 버리기 어려웠다. 그 안에 한때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물건과의 이별은 기능보다 감정의 문제였다. 필요 없음을 알면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물건은 어느 순간 '쓸모'를 넘어 익숙함과 기억, 그리고 한때의 나를 저장하는 매개가 된다. 오래 입은 코트나 쓰다 만 다이어리, 고장난 카메라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같다. 그것들은 분명히 한동안 내 생활의 일부였다.
계절이 바뀌거나 이사를 준비할 때면 익숙한 것들과 다시 마주한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웨터나, 한동안 듣지 않은 바이닐 레코드를 꺼내들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왜 이걸 아직 가지고 있지?"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추억과 미련,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겹쳐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들은 오랜 시간 지금의 나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버리는 일은 때로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렇다고 이별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워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다. 머그잔을 정리하며 나는 그 시절의 아침을 떠올렸다. 서툴고 분주했던 스물아홉과 서른셋, 늘 미지근했던 커피,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책상 한켠에서 나뒹굴던 컵.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기억은 오히려 또렷했다.
물건에는 시간이 스며든다. 오래될수록 삶의 흔적이 그 위에 쌓인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떠나보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보내고 다음 시간을 맞는 조용한 의식에 가깝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수집해 왔다. 각 물건에 이야기를 묶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을 저장해왔다. 그러나 그 수집의 끝에는 언제나 이별이 있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애틋함과 허전함을 안은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영화처럼, 삶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별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오늘 나는 오래된 머그잔과 작별했다. 오랜 시간 곁에 있었기에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남김'이다. 익숙함을 놓아 보낸 자리에는 그 시절의 내가 더 또렷하게 남는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시간이 조용히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