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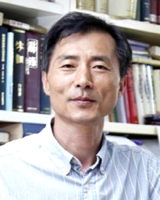
누구나 몸 바쳐 무언가를 사랑하다 죽는다. 한 마디로 자기 손으로 "제 무덤을 판다." 개인적 이익이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든 저마다 무언가에 파고들다 거기에 묻힌다.
가령 천상병 시인이 '새'라는 시에서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내 영혼의 빈 터에/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처럼 냉랭히 자신을 성찰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귀천」)는 시인의 그늘 없는 한 마디에서 삶의 숭고함을 느낀다.
난초의 꽃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처럼, 삶도 적당히 여유 있을 때, 하직하는 것이 아름다우리라. 하직이란 '일을 그만두거나, 떠나거나, 작별하는 것'을 말한다. 박목월은 '난'이란 시에서 하직이란 말을 썼다. "이쯤에서 그만 하직하고 싶다./좀 여유가 있는 지금, 양손을 들고/…여유 있는 하직은/얼마나 아름다우랴." 꽃잎이나 낙엽처럼 좀 아쉬울 만할 때 하직하는 것은 품격있고 '귀'한 일 아닐까.
물론 '깨끗한', '귀한' 것만을 추구하라 닦달해대는 것도 좋지는 않다. 청렴에 대한 집착이고 욕심이기 때문하다. 『채근담』에서는 이 점을 잘 지적한다.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다. 청렴하다는 명성을 내세우는 건 바로 이름을 탐하는 까닭이다."
대개 동양인들은 '부・귀'를 좋아한다. 하지만 부와 귀를 다 가지기는 어렵다.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긴 하나 삶이 천박할 수도 있고, 권세나 명성이 높으나 가난에 찌들 수도 있다. 부귀를 누리면 흔히 "복 받았다"고들 한다. 사실 이런 기복적 태도의 근저는 어딘지 단조롭고 가볍다. 왜 그럴까. 기복의 추구는 으레 공공보다는 개인을, 남보다는 나를, 세계나 신격보다는 인간을 우선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야에는 '참된 것'[眞], '착한 것'[善], '아름다운 것'[美], '성스러운 것'[聖]의 가치 추구가 미약하다. 오직 자본과 권력만이 주된 목표가 된다. 그래서 타자나 초월의 가치를 망각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무조건 이기고 보라!"고 떠들어댄다. 출세와 권력 쟁취를 위해선 어떤 간악한 수단도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의 천박성, 무자비성, 비윤리성이 일상화되면, 정직한 사람은 못 살고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다 사기 치는 인간이 승승장구한다. 이런 데 지지와 박수를 보내는 성찰 없는 사회가 무슨 수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갈까.
조선시대에 일반인은 물론 식자층에서도 유행했던 점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 우복 정경세이다. 그는 평생 점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점이 화복(禍福)을 알 수 있다고 해도 화복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복이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먼저 알아봤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그가 "가장 기특한 점(占)"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일을 점쳐서 화복을 아는 것"이었다. 개인적 길흉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의당 해야 할 일을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선비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염치(廉恥)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염치 있는 식자층을 원했다.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목전의 '몰염치' 정치인들을 한번 둘러보라. 그렇게도 세상을 속이며 살고 있으나 퇴장하지 않는, 비정상적 군상을. 하기사 옛날에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사람이 사는 것은 정직함이다. 속이는 사람[罔]이 사는 것은 요행으로 죽음을 면한 것이다."(『논어』 「옹야편」)라는 토로를 보면.
세상이 어수선할 때마다 나는 김수영의 시 '폭포'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누가 보든 말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곧게 떨어지는 폭포수.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곧은 소리는 곧은/소리를 부른다."
곧은 물줄기에서 몸을 씻어내는 듯한 위안을 느끼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 올곧음, 즉 '직(直)'을 생각한다. 직하하는 폭포수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의당 해야 할 일만을 묵묵히 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숙직, 그날 당번으로서 직장을 지키는 일직. 그리고 산지기, 문지기, 등대지기…, 무슨 무슨 지킴이. 다 '직' 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직 자에는 "열 눈[十目]이 보는 바이며…" "숨은 것[隱]보다도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엄중한 자기 성찰의 정신이 살아있다. '많은 눈'[十目]으로 보고 있으니 '숨길'[乚]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처럼 세계의 온갖 '감시의 눈', 그리고 우리 몸의 해와 달인 '두 눈'과 내면의 '양심'이 작동되고 있음을 말한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을 떠올려본다. 부릅뜬 두 눈은 세상을 다 보고 있는 듯하다.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다그치듯 말이다. 몇 년째,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부정한 정치…선거. 이를 지켜보는 올곧은 수많은 양심의 눈. 혼탁한 이 풍진의 나라가 그나마 지켜지는 것은 평범한 올곧은 양심들 때문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