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금석 지음/ 지식의편집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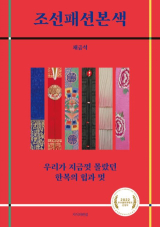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말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아랫사람에게 더 후하게 주고 윗사람은 덜 받는 쪽으로 연봉을 조정했다'는 식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표현이다. 원래는 조선 후기 유행한 패션 스타일을 설명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라고 한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된다. 몸에 꼭 맞는 짧은 저고리와 넉넉하게 부풀린 치마 입은 여인 여러 벌 속옷을 껴입어 잔뜩 부풀린 치마(하후)와 젖가슴이 드러날 만큼 짧은 저고리(상박)는 18세기부터 개화기까지 유행한 우리나라 여성의 옷차림이었다.
조선 여성들의 옷차림엔 유교 관념이 투영돼 있다. 한편으로 조선 여성들의 의복엔 이중성이 담겨 있다. '절제된 소박함' 이면의 '요염한 관능미'가 그것이다.
'복식'은 옷과 장신구를 아우르는 말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패션'이다. 사람들의 마음, 철학, 정치, 경제 등 그 시대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패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통 복식을 정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규격화된 제복이나 의례복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한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의식 또한 맞물려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도 시대와 호응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한복 또한 과거에 박제된 복식이 아닌, 현대의 문화와 삶을 반영하는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조선패션본색'은 숙명여대 의류학과 명예교수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인 지은이가 전통 패션에 담긴 멋과 사상, 의미 등을 조명한 책이다.
지은이에 따르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복은 남녀구별이 없었다.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으며, 그 근간은 유교 이념이었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얼굴은 쓰개치마로 감싸고, 가슴은 치맛말기로 꼭꼭 싸매고, 하체는 치마로 칭칭 둘러 다른 남자들의 시선으로부터 꽁꽁 감춰져 있었다. 특히 여성의 정숙함에 대한 사회적 강요는 치마 속 속옷 패션에서 정점에 달한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무지기치마, 대슘치마, 예장용 겉치마 등 그 명칭도 다양한, 무려 일고여덟 겹의 속옷으로 하체를 싸고 또 싸서 겹겹이 겹쳐 입었다. 하나의 아이템으로 각 부위별 구속의 틀을 만들어낸 '치마' 패션은 당대 사회의 집요한 관념이 작용한 산물이었고, 이렇게 조선 여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패션으로도 구속당했다는 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남녀의 머리모양에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을 향해 솟은 남자들의 상투는 고대부터 조선까지 이어졌다. 반면, 고려시대 여자들의 하늘을 향한 올림머리는 조선에 와서 땅을 향한 댕기머리로 변했다. 여기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남녀유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머리숱이 많아 보이기 위해 사용한 가체는 '땋은 머리를 덧넣어 얹은 머리'를 일컫는다. 흔히 '다래' 또는 '다레'라고도 한다. 표준어는 '다리'다. 그렇다면 가체의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올림머리 등을 미뤄볼 때 고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특히 사대부집 여인들의 크고 높은 얹은머리는 부와 권력의 척도였다. 머리치장에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체 값이 치솟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은이는 이밖에도 조선 패션 품격을 완성한 '쓰개'에서부터 조선의 대표적인 유니섹스 패션으로 부를 만한 '장옷'에 이르기까지 조선 복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 규정화된 이미지로 소화되는 모습이 안타깝고 불편했다. 우리 복식이 품고 있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지은이가 책을 낸 이유다. 328쪽, 2만1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