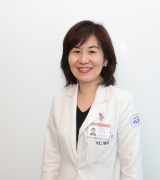
소아재활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보니 뇌성마비나 발달지연, 자폐 이런 조금은 중한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함께 만나는 보호자들도 종종 불안해 하고, 걱정도 많은 편이다. 외래에서도 그렇지만 입원환자 회진을 돌다 보면 한번씩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보호자들이 있다.
사실 처음 의사 생활을 할 때는 회진을 돌다가 나도 함께 울어버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능숙하게 농을 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좋아질 수 있다고 달래기도 한다. 얼마나 걱정되고 속상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저렇게까지 울 환자는 아닌데 어머니 걱정이 지나치다' 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다인실에서 바로 옆 더 중한 환자 보호자들도 잘 견뎌내는데, 훨씬 경한 환자 보호자가 살고 죽고를 운운하며 회진 때마다 울음을 보이면 중환 보호자들에게 미안해서, '엄마가 그러면 옆의 이 엄마는 어떻게 견디라고요' 하며 타박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환자가 되기도,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아들이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렸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번은 겪는 일이고, 원 상태가 안 나쁘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큰 문제없이 좋아지는 병이다. 그런데 원래 천식이 있었던 아들이 산소 수치가 좋아지지 않고 깨지 않는 거였다. 그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었는지. 한숨도 못자고 밤새도록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다. 바쁜 엄마라 옆에 있어 주지 못해 폐렴이 생긴 것 같고, 내가 빨리 감지를 못해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고. 끝없이 꼬리에 꼬리는 무는 죄책감으로 눈물도 흘렸던 것 같다.
그랬다. 머리로는, 좋아지는데 며칠은 걸리고 그리 걱정할 병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당장 좋아지지 않는 아이 앞에 나는, 얼마나 불안해 했었던가.
회진을 돌면서 말이 늦는 아이 때문에 내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보호자에게, 그만한 일로 눈물을 보이면 옆의 엄마들은 어떻게 견디냐며 타박을 주었던 의사도 사실 보호자가 되어 보니 그 흔한 폐렴에 걸렸다고 밤새 불안해 하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래 난 오만했다. '이만한 일은 울 만하다, 이만한 일은 울만한 일이 아니다' 이십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의 경중을 가르고 그 앞에 오롯이 의사로서 나는 오만했다. 막상 보호자가 되어 보니 그게 아무리 경한 병이라 해도 불안하고 무섭고 눈물이 나는 것을.
그래 이제 반성한다. 살짝 손을 베어 밴드붙이면 될 일도 덧나면 어쩌지, 물에 손을 넣어도 되나, 별별 걱정으로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데. 그 정도는 심한 상처가 아니니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고 핀잔주었던 나의 오만함을 반성한다.
의사로서 같은 질환을 몇 십년 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공식 비슷한 게 생기는 느낌이다.이 병은 이렇게 치료하고, 저 병은 저렇게 치료한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병을 가진 환자이지 병이 아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똑같은 환자도 한 명도 없다.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에 병을 대입시키지 못하고 책에서 배운 병을 사람에게 대입시켜 환자가 아닌 병으로 환자를 분류한 오만함을, 의사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지극한 오만함이었던 것을 반성한다. 부끄러웠던 날, 나의 오만함으로 상처받았던 보호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한다. "죄송합니다"
손수민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