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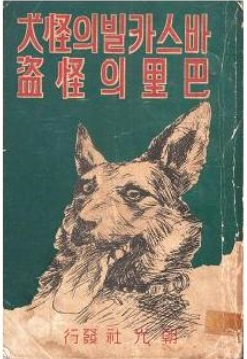
197, 80년대 '명랑'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서점보다는 역 구내, 혹은 시외버스 터미널 매점 가판대에서 주로 모습을 보이던 통속오락잡지였다. 터미널 가판대용답게 내용은 시간 때우기 좋도록 가벼운 읽을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통속오락잡지의 이름을 왜 '명랑'이라고 한 것일까. 그 이유를 일제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단어 '명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여기에서도 '명랑', 저기에서도 '명랑', 명랑이 과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1941년 출판된 박태원 번역소설 '파리의 괴도' 서문에도 '명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파리의 괴도'(1941)는 미국탐정소설 '백만 프랑(One million francs)'을 번역한 것이다. 저명한 범죄학자 듀발이 악당에 맞서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위기에 처한 여주인공을 구해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원래 출판사 측에서 제안한 것은 반 다인의 정통탐정소설 '그린살인사건'이었다. 박태원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파리의 괴도'를 번역작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 선택 이유가 재밌다. 음산하고 잔혹한 반 다인의 탐정소설과 달리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건전하고 명랑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코미디냐 하면 그 것도 아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악당도 등장한다. 단지 그 내용이 허리우드식 모험활극에 가까워서 독자들이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일제말기 동안, 가벼운 읽을거리가 건전하고 명랑한 오락으로서 칭송받고 있었다. 당연히,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것은 불건전한 것이 되어버렸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이 기묘한 이분법은 태평양 전쟁으로 향하고 있던 일제말기의 정치적 상황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에 이어서 서양세계와의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일제로서는 내부의 모든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고 단속하여 일사불란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데에 명랑한 오락은 더할 나위 없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40년의 조선 사회는 백백교 사건으로 무겁고도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있었다. 백백교 사건이란 사이비종교 백백교 교주 전용해가 400명에 달하는 신도를 살해한 사건이다. 국운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제로서는 이 미개하고도 음울한 분위기를 정비해서 조선인의 에너지를 전쟁에 퍼붓도록 해야만 했다. 여기에도 역시 '명랑한 오락'의 전파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우리는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더욱 강렬하게 느낀다. 명랑함만으로 이루어진 사회. 이런 사회에서 누가 과연 행복과 기쁨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명랑'이데올로기를 보고 있으면 이 그로테스크한 발상을 고안해낸 시대의 어둠과 불건전함, 비정상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빛과 어둠, 슬픔과 기쁨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자명한 진리에서 이 시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