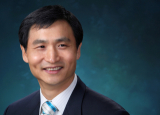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4달러이던 시절, 미국의 명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는 당시에는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 기후와 날씨를 시계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자 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시각화한 그래픽도 만들었다. 날씨는 패턴이 있는가?
로렌츠는 시뮬레이션 하나가 의미 있다고 보고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의 한심한 컴퓨터 성능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가동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를 입력해 중간 과정에서 시작했다. 결과는, 유사하기는커녕 장소도 일시도 전혀 관련 없는 두 날씨가 나왔다. 왜 이렇게 달라졌지?
로렌츠 교수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 전 과정을 복기한 결과 컴퓨터도 정상이고, 버그도 없었다. 0.506127과 0.506, 입력 수치가 극히 미세하게 달랐을 뿐이었다.
처음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로 입력했고, 다음에는 세 자리까지 입력한 것이다. 0.000127 차이. 로렌츠 교수는 11년 후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회오리바람을 촉발하는가?' 20세기 말 학문과 현실 세계를 뒤흔든 복잡성 이론의 단초가 된 '나비효과'다.
우리는 자주 '숫자에 불과하다'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문과 문화, 경제와 군사 모든 면에서 서양을 압도하던 동양이 역전당한 것은 18세기 말부터다. 산업혁명 이후 뉴턴 이후, 정확히 말하면 숫자와 수학을 등한시해서다. 앞으로도 작은 숫자를 무시하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을 흉내만 낼 뿐, 따라가기 급급할 것이다.
학문과 문화, 부국강병이 모두 숫자에 있다. 대세는 작은 숫자가 결정한다. 설도 쇴으니 올해는 숫자를 잘 챙기자. 작은 숫자에 신경 쓰자. 그리하여 한국이 21세기 세계사의 중심에 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