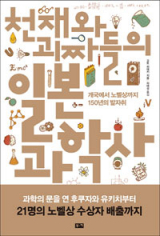
천재와 괴짜들의 일본 과학사/ 고토 히데키 지음/ 허태성 옮김/ 부키 펴냄
일본을 어떻게든 꺾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은 축구 경기에서, 전자제품 판매 경쟁에서, 아이돌 음악을 비롯한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거나, 예전에는 지기만 했는데 요즘은 종종 또는 거의 이기거나, 대부분 종목에서 지더라도 어느 한두 종목만큼은 꼭 이기고 만다. 한국과 일본이 세상 꽤 많은 곳에서 대결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 아예 발조차 내딛지 못한 장(場)이 있다. 과학 분야 노벨상(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이다. 여기서만큼은 일본과 한국은 어른과 애, 아니 거인과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무언가 같은 구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썼다. 2015년에는 생리의학상(오무라 사토시)과 물리학상(가지타 다카아키) 등 무려 2개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탔고, 2014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공동 수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이 최근 와서 반짝하며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최초로 (과학 분야 포함)노벨상을 수상한 때는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물리학상을 거머쥐었다. 이후 일본은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6년 수상까지 포함해 22명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왔다. 물리학상 11인, 화학상 7인, 생리의학상 4인 등 3개 분야에서 고르게 받았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초과학'이 외면 받는 우리나라 현실을 개탄한다. 그렇다면 당장 기초과학을 사랑한다고 현실이 확 바뀔까. 아니다. 일본을 보면 그 사랑의 결실을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50년도 훨씬 전부터 과학에 운명을 걸었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1868년)에 이르는 변혁기에 근대화의 도구로 과학을 주목했다. 1860년대부터 서양 각국으로 과학 유학생을 보냈다. 유학에서 돌아온 야마카와 겐지로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1888년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한국 최초의 물리학자로 알려진 최규남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1933년이다. 그로부터 16년 뒤 일본은 첫 노벨상을 수상했다. 일본이 노벨상 후보에 오른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다. 1900년대쯤 아드레날린을 발견한 물리학자 다카미네 조기치와 세균학자 기타사토 시바사부로가 1회 노벨상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일본 과학은 한국 과학과 게임조차 안 되는 위치에 선 것이다.
일본이 단순히 학문적 업적을 쌓기 위해 과학에 매진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과학으로 산업을 일으켜 국력을 키우고자 했다. 강한 국력으로 불평등조약을 요구하는 서양과 제대로 겨루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군사적 목적도 있었다. 아시아의 근대 시기에 서양은 경쟁하듯 청나라, 월남, 인도, 루손, 자카르타 등을 유린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과학으로 군사력을 높여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일본은 과학을 전쟁에 악용하고 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략을 뒷받침하는 무기로 쓴 것이다. 731부대의 인체 실험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전쟁 후인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계속 과학에 매진하게 만든 동력은 뭘까. 잘 조성된 연구 시스템과 연구 문화다.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1917년 출범한 100년 전통의 민간 과학 연구소다. 이곳은 "일본인의 폐단은 너무 서둘러 금방 응용(과학) 쪽을 개척해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카미네 조키치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이후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명 배출했다. 응용과학만 바라보지 말고 기초과학의 힘을 쌓자는 각성을 한국은 이제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화학연구소는 일본의 연구 문화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이곳 연구원으로 있던 니시나 요시오는 192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느끼고 와서는 상하 구별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코펜하겐 정신'을 연구소에 불어넣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구도가 엄격한 강좌제 대신, 자유롭게 서로를 대하는 연구실 제도가 확산됐다. 그러면서 방목형 교수들도 나타났다. 제자가 원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제자가 교수의 연구에 협력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후 각자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례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고시바 마사토시는 대학 동급생들이 1분도 안 걸려 푸는 수학 방정식 문제로 일주일을 끙끙 앓았다. 그러나 실험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이후 고시바는 우주선(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방사선) 실험에 매진했다. 우주선 연구로 유명한 뉴욕 로체스터 대학에서 유학했고, 실험을 하러 지하 1천m 폐광산으로도 내려갔다. 여기서 실험을 통해 중성미자를 검출한 성과로 고시바는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평생 효모만 연구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오스미 요시노리를 비롯해 일본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한 우물만 팠다.
만약 고시바 마사토시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우선 대학 시험에서 수학 방정식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학점을 좋게 받을 수 없고, 애당초 거기서 과학자의 꿈은 중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432쪽, 1만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