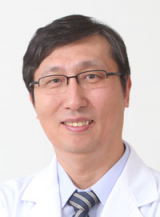
요즘 산부인과에서 30대 중'후반의 환자를 진료할 때, 자녀가 몇 명인지를 물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혼 여성에게 자녀 수를 물어본 의사나 질문을 받은 환자 모두 난감한 상황을 겪는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수가 20대 중'후반의 젊은 산모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아이를 낳는 연령도 동시에 늦어지고 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1960, 70년대에는 연간 신생아가 100만여 명 정도 태어났다. 그러나 지난해는 43만여 명으로 신생아 수로 보면 절반 이상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몇 명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포르투갈과 함께 꼴찌를 다툰다.
더욱 심각한 것은 35세가 넘는 고령 산모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대학병원 분만실에는 대부분 30대 중'후반의 초산부가 대다수이고 다산부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한 아이보다 미숙아 등 고위험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 2006년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투입한 예산이 80조원이 넘는다. 올해에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오히려 줄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의 깊은 터널에서 탈출할 묘수는 없을까. 저출산은 국가에서 돈을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여론과 정치인에 휘둘려 온갖 정책을 짜내는 정부도 잘못됐긴 마찬가지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체계적이고 차분한 교육을 통해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 자신만 소중히 하며 결혼도, 아이도 거부하는 풍토를 통렬하게 비판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출산도, 교육도, 일자리도, 노후도 정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인생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꾸준히 함양함으로써 저출산과 인구절벽론의 깊은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도 아이들과 젊은이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