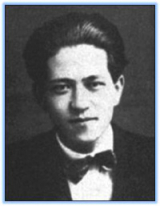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異國)의 계집애야! '독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독크는 비에 젖었고 내 가슴은 떠나가는 서러움과 내어 쫓기는 분함에 불이 타는데 오오 사랑하는 항구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독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난간은 비에 젖어 있다."
임화의 시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1929) 첫 구절이다. 이 시는 애인을 두고 일본 땅을 추방당해 떠나야 하는 한 조선인 청년의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별 장소가 이국땅 요코하마 그것도 비 내리는 부두여서인지 그 이별이 더욱더 가슴 저린다.
시의 화자인 조선인 청년은 1926년 개설된 게이힌쵸센선(京浜朝鮮線) 항로, 즉 일본 도쿄에서 출발하여 요코하마를 거쳐 조선의 부산, 경성, 진남포로 향하는 항로를 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선에 도착했을 것이다. 과연 조선인 청년은 멀고도 긴 이 여행을 다시 돌아서 요코하마에 두고 온 이국의 계집애, 일본인 애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요코하마와 경성의 거리를 넘어선, 제국과 식민지 간의 거리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둘의 재회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시 속의 조선인 청년은 이렇게 항변한다. 함께 '눈 오는 밤을 몇 번이나 가리(街里)에서 새'우고,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맹서했던 우리들에게는 근로하는 형제'라는 그 강인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말하자면 노동자 해방이라는 고귀한 사상으로 뭉쳐진 마음이 있기에 식민지와 제국 간의 거리쯤이야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를 쓴 스물두 살의 낭만적 시인이자, 사회주의 사상가였던 임화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듯하다. 게다가 이때는 이념적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조선인 박열과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의 목숨을 건 사랑의 일화가 일본과 조선을 뒤흔든 직후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을 넘어, 이념적 동지애로 뭉쳐졌던 두 사람의 사랑이 가네코 후미코의 자살로 마감되었듯, 일본인과 조선인 연인을 둘러싼 현실이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임화의 순수한 믿음과 달리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근로하는 형제'라는 이념적 동질감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임화에게 있어서 일본 노동자들은 근로하는 형제였지만, 대다수 일본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에게 조선인 노동자는 동지가 아니라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잡이요 뒷군", 즉 '식민지 노동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해방 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월북했지만 마흔여섯의 나이에 미국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임화의 비극적 삶은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임화가 믿었던 '근로하는 동지'라는 계급적 이념은 환상이었던 것이다. 이념적 환상을 좇아서 끊임없이 뛰어간 것은 임화만이 아니었다. 근대적 세계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일본을 향해 쫓아갔던 이광수 역시 해방 후 납북되어 친일행위에 대한 단죄로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다. 선택한 이념은 달랐지만 임화와 이광수가 본 것은 식민지의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이념에 휘둘려 비극적 운명을 맞은 임화와 이광수의 삶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전체가 직면한 운명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