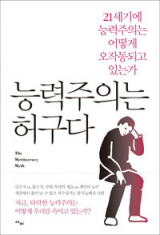
능력주의는 허구다/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지음/ 김현정 옮김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노력=성공'의 등식이 성립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탓이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윌밍턴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인 두 저자는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오작동되고 있다'면서 21세기 능력주의 신화의 문제점과 그 부작용, 위험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한 이 책을 내놓았다.
'능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만, '능력주의'는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란 말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자신의 풍자소설 (1958)에서 처음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그는 완전한 능력주의가 실현된 미래 사회는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지배되는 무자비하고 암울한 디스토피아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만 쌓는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를 열렬히 환호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켰다. 이 때문에 개인의 능력적 요인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해 온 반면, 비능력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해 왔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능력 시스템을 토대로 돌아가려면 모두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펼치고 있는 삶의 레이스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판을 다시 짜서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경주'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배턴을 물려받는 '릴레이 경주'가 되어버렸다. 애당초 결승전 입구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상속이 먼저이고, 능력은 그다음이다. 특히 '무형의 상속 자산'이 부의 세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사업체, 현금 등 유형의 자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부모가 쌓아놓은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맥(사회적 자본),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누려온 충분한 문화적 자원(문화적 자본), 부모의 재산 덕에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모의 지위 덕에 취업 시 받는 특혜 등이 자녀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형의 상속 자산이다.
저자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능력주의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와 교육'을 불평등한 삶을 자녀 세대에까지 대물림하는 데 일조하는 '잔인한 매개체'라고 진단한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학교와 교육이 능력적 요인보다 비능력적 요인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비판인 셈이다.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능력이 중시되며,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권력자들의 강인한 의지'이다.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 특히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조세 정책과,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수 지출 프로그램, 부유층의 좁은 관심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저자들의 주장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 훨씬 더 절실하게 들린다.
336쪽, 1만5천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