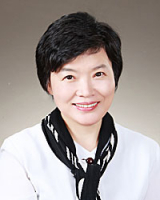
박원순법 이해충돌방지 있으나
자발적 참여는 '빛 좋은 개살구'
김영란법 민간언론 포함은 찬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종 논란을 자초하기도 하는 자칭 '서민시장'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는 아내의 성형설에 휩싸였고, 최근에는 키우던 진돗개 3마리를 '청사 방호견'으로 둔갑시켜 천수백만원의 세금을 낭비했다. 잠잠해질 만하자, 28억원 한옥을 시장 공관으로 빌려 또 입방아에 올랐다.
'가면을 벗어라'는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이 도리어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공직사회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했다.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는 꼴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부패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김영란법과 같이 주목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에서 3대 핵심 사항인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항목이 빠져 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이 항목이 빠진 데 대해서 여론은 '반쪽'짜리로 전락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으로 1인당 연봉 1억3천800만원씩 쓰는 국회의원 295명이 부패 고리를 끊고 새로운 국가로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을 수행하는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소명감이 떨어져서야 쓰겠는가.
그런 박원순법도 미생이기는 마찬가지다. 박원순법의 경우,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급 이상 공무원(실'국'본부장 등 52명)만 대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받지만, '자발적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조례를 적용하면서 '자발적 참여'라는 우산을 준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박원순법도 대상 범위를 서울시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확장하여야 그 진정성이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체제가 달라져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부패근절은 탑다운 방식이어야 성공한다.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오로지 나라를 살리려는 일념 외에 다른 탐심이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각료들도 마찬가지로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수령이 지켜야 할 첫 계율은 청탁 금지라고 썼을까.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부패근절에 민간이 어디 있고, 공직이 어디 있으며, 좌우가 어디 있고, 빈부가 어디 있는가. 공익을 띤 민간영역 가운데, 법률가'시민단체'금융도 시급히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문 닫힌 공직에 대한 비리 접촉이 더 은밀하게 더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김영란법에 언론이 포함된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기레기'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사회질서를 선도할 기회이다. 왜 월급 받는 공무원들에게만 그 역할을 덮어 씌워야 하나. 언론사도 취재하든, 뭐를 하든 뒷돈을 받지 않아야 언론의 본래 기능인 워치독(watch dog,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돈 독(毒)과 무관한 청렴한 언론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꼼수로 김영란법을 피해간 국회의원들이 청탁과 이권 개입을 저지를 수 있을까. 김영란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그런 국회의원들 찾아내기란 여반장(如反掌)이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공직자'공적 영역에서 첫째 언론, 둘째 국회의원, 셋째 법조인, 넷째 교수사회와 교원, 다섯째 시민단체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오염된 정치도, 기레기 언론도, 뒷돈 공작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