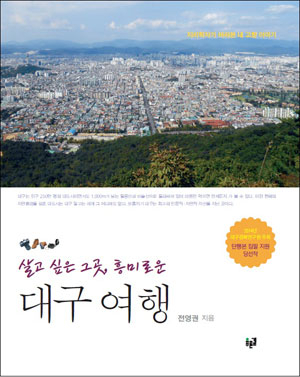
대구를 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지라는 말일까. 대구(大邱)라는 명칭이 역사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신천(新川)'은 원래 '새로운 물줄기'라는 말이었을까?
지리학자 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펴낸'대구여행'은 대구의 역사, 지리, 문화, 풍광 등을 통해 대구가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인문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인지를 보여준다. 지은이가 20여년 넘게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책은 '위성사진을 보면 남쪽 비슬산 기슭에서부터 북쪽의 팔공산 기슭에 이르는 곳까지 가상의 원을 그릴 수 있다. 이 원 안의 너른 평지가 대구분지의 범위'라고 말한다. 약 1억 년 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일대는 호수였다. 그러므로 대구분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호수에 퇴적된 퇴적암이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퇴적암을 '층석(層石)'이라고 불렀는데 대구사람 특유의 발성 때문에 흔히 '청석(靑石)'으로 발음되기 일쑤였고, 이러다보니 '푸른 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은이는 대구분지와 관련해 사람들이 '분지적 사고니, 고담도시니, 수구골통도시'니 하는 말들은 대구에 대한 오해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한반도는 산지가 70%이고, 부산, 인천, 울산, 포항, 목포, 군산, 강릉 등 해안가 주거지를 제외한 내륙은 모두 분지인데 유독 '대구를 분지'라고 하면서 비꼬는 것은 1960∼1970년대 잘 나가던 대구에 대한 질투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구사람들 역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지은이가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는 한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도시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보다 200년 앞서 제작을 발원한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보관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승병 총사령관인 사명대사가 동화사에 주둔하면서 승병사령부를 지휘한 곳이기도 하다.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오면서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최고 지역이 되었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천300만원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도 대구다. 1950년 6.25때는 낙동강 방어선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도시다. 그런가하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학생의거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대구(大丘)라는 명칭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이다. 원래는 다벌, 달벌, 달구벌, 달구화, 달불성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지은이는 삼국통일 이후 달구벌이 대구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구의 구는 '언덕 구(丘)'였다. 구(丘)가 구(邱)로 바뀐 것은 조선 영·정조 때로, 1750년 대구의 유생 이양채가 대구의 구(丘)가 공자의 휘(諱)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전체 제목은 '살고 싶은 그곳, 흥미로운 대구 여행'이다. 총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구분지의 지리적 범위를 시작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대구의 모습, 대구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의 특성과 문화지형, 신천의 진실과 동화천의 문화생태, 조선시대 대구의 풍광, 대구의 명소와 대구지역 풍수 등을 소개한다.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교수인 지은이는 "이 책이 내 고장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더 자세히 알고, 소중하게 가꾸어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212쪽, 1만5천원.
조두진 기자 earful@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