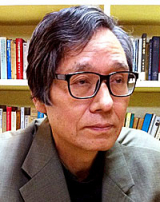
미국의 국민적 시인이었던 월트 휘트먼은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 첫 부분에서 "나는 빈둥거리면서 내 영혼을 초청한다/ 나는 여름 풀잎 끝을 보면서 내 편한 대로 비스듬히 기대어 빈둥거린다"고 노래한다. 그는 자신이 빈둥거리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초청할 수 없고 풀잎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왜 그는 빈둥거리면서 자기 영혼을 초청할까?
영혼만 만나려면 꼭 빈둥거릴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정말 초청하고 싶은 것은 시적 영감이고 상상력일지 모르며, 이것은 바둥바둥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되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의 영감은 뮤즈, 아폴로, 디오니소스 같은 신이 내려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서사시 시인들은 맨 먼저 신에게 영감을 달라고 기원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한다.
영감은 시인이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학자들도 필요로 한다. 논문의 질은 어떤 영감을 받고 썼느냐, 또 어떤 영감을 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또 대단한 영감을 가지면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열 수도 있으니, 이것은 독창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페르디낭 소쉬르는 언어에 대해 통찰을 하면서 시대를 뒤엎는 영감을 얻었는데 그것은 언어를 수천 년 보아왔던 통시적인 체계에 다시 공시적인 체계를 얹어 본 것이다. 한 낱말이 발화될 때 발화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낱말의 체계를 상정한 것이 그의 이론을 펴는 단초가 되었다. 그 단순한 착상이 오늘날 구조주의라는 새로운 물결을 가져왔음을 생각해 보면 영감 하나가 가져올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삼국사기'를 읽은 일연 스님도 분명 하나의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원칙으로 기술한 편년체의 사서(史書) 너머로 분노처럼 울컥 치미는 민족정신이나 민족정기, 민족의 감성, 혹은 상상력이었을지 모른다. 우리 민족을 사실(史實)만으로 서술하다 보니 천금 같은 우리 민족 고유 정신, 정서, 상상력, 무의식, 감성 같은 것이 빠져버림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 문화에서 누가 소쉬르나 일연 스님처럼 멋진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참신한 영감이 있어야 예술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대학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데 말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너무 각박하여 휘트먼의 '빈둥거림'을 가질 여유가 없다. 대학 구성원들은 창의적인 연구자 혹은 예술가라는 정신적 이미지보다는 빨리 논문을 생산해야 하는 유물론적 노동자라는 느낌이 더 든다. 그렇기에 그들은 노동자처럼 '성과급'을 받고 또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회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고 그 경쟁력의 생명은 바로 생산량 즉 발표된 저작의 편수에 있다.
소쉬르나 일연 스님이 우리 지역의 한 국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최근 국립대학에서 시행 중인 '성과급적 연봉제'에 맞춰 연구 업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쉬르는 연구 업적이 전무하니 무능한 교수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고, 일연 스님은 업적은 다대하나 학문적 가치가 있느냐, 즉 학문적으로 보면 황당하지 않으냐는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대학에 남아 있으려면 빨리 학문은 접고, 수업 시수나 학생 상담 횟수를 늘리고 보직자, 교외 자문위원, 학회 임원 등이 되어 점수를 얻는 수밖에 없다. 사실 별의별 것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예컨대 교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도 0.1점을 얻고, 입시 감독을 하여도 0.1점을 얻고, 장학금 기부를 하여도 몇 점을 챙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높은 성과를 낸 교수에게 봉급의 일부를 뺏기는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 연봉제는 서로 봉급을 뺏어 먹는 이른바 '상호 약탈식'이기 때문이다.
소쉬르와 일연 스님이 대접 못 받는 제도하에서 참신한 대학 문화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당장 성과가 없다고 연구실을 빼라고 하거나 봉급을 잘라 버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성급함 때문이다. 더 위험한 것은 교수들이 소쉬르와 일연 스님 같은 업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못 살린 채 이 연봉제에 조금씩 길들어 가는 것이다.
박재열/시인·경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