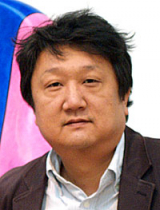
종교의식엔 일반적으로 꽃을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헌화의 절차가 따른다. 불교에서도 '꽃 공양'은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고, 성당의 미사에서도 '제대 꽃'은 빠질 수 없다. 종교에서 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장엄 혹은 찬탄의 상징이며, 종교적으로 승화된 삶의 표현이다. 어찌 보면 종교 행위에 사용되는 꽃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꽃은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등식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꽃의 형식을 빌려 드러내지만 그 아름다움은 조형적 쾌감이 아니라 숭고함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나는 특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건, 성당이건, 절이건 부담 없이 들어가 행사의 참관인이 되거나, 빈 예배당에서 그냥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익숙해지면 시선은 자연스레 이곳저곳을 응시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꽃들을 만난다.
탐스러운 생화로 화려하게 꾸며진 꽃바구니나 화병을 보면, 내가 모르는 종교적 배경이나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 모습이 믿음이나 초월자를 향한 마음을 담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위한 예쁜 장식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봐서 아름답고 우아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미적 취향일 뿐, 초월자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지, 사람이 봐서 예쁜 꽃, 종교적 신성함과 고귀함을 느낄 수 없는 꽃,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의 가치를 감각적인 쾌락의 양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그대로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 현실을 가장 경건해야 할 곳에서조차 보고 있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시작에서부터 원시미술의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 방법을 본보기로 삼았다. 역사적으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 명확했던 시대의 미술은 재현의 기교보다는 간결하지만 느낌의 전달에 충실했고, 가시적인 미적 조형 언어를 넘어 '정신'의 표현에 충실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거의 사라져가던 전통 지화를 오랜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복원하신 대구대학교 김태연 교수의 연구소에서 마주한 '우리의 종이 꽃'은 내가 본 꽃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통 지화는 오랫동안 우리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어 왔으나 일제에 의해 맥이 끊겨 일부 장인들을 통해서만 겨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거리에선 플라스틱으로 조잡하게 흉내 낸 상품의 모습으로 종종 마주칠 뿐이다.
전통 지화는 꽃의 큰 특징만을 담아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며, 그 배치는 극히 단순하다. 수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을 간단한 규칙에 따라 밀도 있게 나열한다. 최소한의 형태가 촘촘히 응집된 모습은 사소한 아름다움의 경지를 가볍게 넘어선다. 휘거나, 굽거나, 늘어뜨리는 우아함이란 전혀 없는 올곧은 마음의 자세만을 드러낸다. 정신으로 승화된 꽃이다.
우리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전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내가 걸어두는 작품이 있다. 1㎠ 크기의 파란 사각형이 무수히 화면을 채우고 있는 정상화의 추상화이다. 그림을 무심코 지나다 이내 발걸음을 되돌려 '파란, 켜켜이 쌓인, 그저 파랗기만 한' 네모란 작품 앞에 서서, 숙연한 모습으로 화폭 너머를 응시하는 수많은 눈빛들을 보았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다. 꾸밈없이 최소화한 형태에 끝없이 반복된 행위로 쌓아올린 밀도가 전해주는 정신을 느낀 것이다. 그 정신은 이제는 너무나도 생경해진 고결함과 숭고함이다. 점점 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소비하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가뭄에 단비처럼 만나는 너무나 선명한 정신에 감동하며 오늘은 그 사각형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가로로 155개, 세로로 258개 이를 곱하니 3만 9천990개다. 한 칸, 한 칸 그린 이 사각형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내겐 숭고한 '네모난 꽃'들로 보인다.
지금 대구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우손갤러리에서 모처럼 정상화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두희/우양미술관 큐레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