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인명·의미 등 다양한 유래說 이제라도 분명한 '정설' 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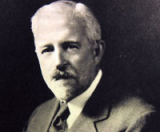
조선 말기 근대관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국내에 들어왔던 호머 헐버트(H. Hulbert)는 당시 아리랑을 채보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미소만 지을 뿐 아리랑의 뜻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나마 아리랑을 언급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아르(아리)'가 러시아어의 첫 발음이라고 말하면서 제국의 영향력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음역한 것으로 아리랑이 '나는 우리 낭군을 사랑한다'라고도 했다. 헐버트는 한국인들이 아리랑의 뜻을 잘 모르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해 적지 않게 황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리랑의 뜻을 잘 모르고 부르기는 마찬가지다. 사전에는 아리랑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민요' 정도로만 소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리랑의 어원에 관해 25개 정도의 학설이 존재한다. 학자마다 어원을 다르게 제시해 어느 것이 정설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중 몇 개의 학설을 제시하면 낙랑(樂浪)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병도의 학설로 고대 낙랑에서 남하하는 교통로의 관문인 '자비령'의 이름인 '아라'에서 음이 변하여 아리랑이 되었다는 설이다. 김지연의 알영(閼英)설은 신라 박혁거세의 비 '알영'의 덕을 찬미하는 것으로 '알영' 또는 '아이영'으로 부르다가 이후에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이규태의 '아린'(고향)설은 비교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여진어의 고향, 즉 '아린'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재숙의 '아랑'(阿娘)설은 밀양 아랑전설의 주인공인 '아랑'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면서 주민들이 '아랑 아랑'하고 부른 것이 변하여 아리랑이 되었다는 설이다. 남도산의 설을 김지연이 소개한 '아이롱'(我耳聾)설은 조선 후기 경복궁 중수 때 원납전 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뜻의 '아이롱'에서 아리랑이 되었다는 설이다. 원훈의와 서병하가 주장한 '아리고 쓰리다'설은 우리말 고어의 조어론적인 분석방법으로 말 그대로 마음이 '아리고 쓰리다'에서 연유되었다는 설이다. 이외에도 인도 신화의 천하만사를 주관하는 '아리람 쓰리람' 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들 학설 중에는 지명과 인명에서 유래된 설이 있는가 하면 말의 의미에서 추론된 설, 전설과 신화에서 유래된 설 등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됐다. 이처럼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정설인지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만큼 아리랑의 어원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부를 때가 되었다. 아니 때가 훨씬 지났다. 120년 전 헐버트가 한국인에게 아리랑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면 스스럼없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아리랑에 대한 이론과 체계적인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유대안<작곡가·음악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