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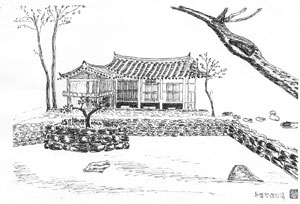
나는 낙지를 좋아한다. 생선과 갯것들을 통틀어 단 한 가지만 택하라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낙지를 집을 작정이다. 만년에 만난 부부가 깨가 쏟아지듯이 늦게 만난 낙지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볼일이 있어 서울에 갈 경우 무교동 낙지집부터 들른다. 낙지의 쫄깃쫄깃한 묘한 맛과 고춧가루가 범벅이 된 화끈함이 어우러진 그 맛이 싫지 않았다. 모든 음식이 지녀야 할 첫째 덕목은 신선함이다.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생명력이다. 한때 즐겨 먹었던 무교동 낙지는 오래전에 목숨이 끊어진 냉동 재료였고 수족관에 살아 있는 산 낙지로 요리할 경우 가격은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낙지 요리는 다양하다. 무교동 낙지처럼 볶음요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열하면 산 낙지 참기름 소금 찍어 먹기, 세발낙지 통째 먹기, 기절낙지, 연포탕, 야채를 곁들인 신선 낙지 철판구이, 살짝 익힌 낙지 고추냉이 간장 찍어 먹기, 세발낙지 먹물탕 라면 끓이기, 낙지 호롱 참숯구이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산 낙지와 호롱 낙지구이를 가장 좋아한다.
낙지 산지인 벌교와 무안 방면으로 여행을 떠날 땐 큼직한 나무 도마와 시퍼렇게 날이 선 무거운 무쇠 칼을 갖고 간다. 산 낙지를 '탕탕 낙지'로 만드는 데는 나무 도마가 최고이며 무쇠 칼은 올렸다가 힘 안 들이고 내려놓아도 질긴 낙지 다리가 쉽게 잘리기 때문이다. 요즘 주부들은 플라스틱 도마를 선호하지만 내려칠 때 들리는 소리와 느낌은 나무 도마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건 클래식과 팝, 아니면 오리지널과 퓨전의 차이쯤 될 것 같다.
도마와 칼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사형도구인 기요틴(guillotine)과 흡사하다. 혁명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틴은 광장에서 행해지던 교수형이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보다 사형수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사형기계의 개발을 제안한 사람이다. 단두대 설계자는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였고 만든 사람은 독일인 피아노 장인(匠人)인 토비아스 슈미트였지만 제안자의 이름을 따 기요틴이라 명명한 것이다. 나의 나무 도마와 무쇠 칼 역시 기요틴의 생각을 모방한 낙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배려의 산물인 셈이다.
간혹 신문의 가십난을 장식하는 '목에 산 낙지가 걸려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는 엉터리일 것 같지만 능히 그럴 수 있는 사실이다. 통 마리 낙지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빨판의 힘이 워낙 강해 식도의 점액질쯤은 무시하고 기도를 막아 버린다. 그럴 땐 대가리를 이빨로 씹어 박살 낸 후 삼켜야 한다. 낙지와의 대결에도 선제공격이 최선의 병법이다.
'행복한 세계 술맛 기행'을 쓴 일본인 니시카와 오사무는 서울의 어느 포장마차에서 산 낙지를 먹은 기억을 이렇게 썼다.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빨판이 입 안쪽에 달라붙는다. 뺨을 일그러뜨려 씹어보니 촉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쾌하다. 접시 위의 낙지 토막은 애벌레처럼 꿈틀거린다. 블랙 유머 같은 느낌이 든다." 블랙 유머! 그렇지. 낙지 다리에 남아 있는 신경의 마지막 항변은 존재에 대한 심한 불확실성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
산 낙지 다음으로 재미있는 것이 낙지 호롱이다. 나무젓가락을 낙지 대가리에 꽂아 감아 돌린 다음 맛깔스런 매운 양념을 발라 참숯불에 석쇠를 놓고 굽는 것이다. 소주를 한 잔씩 돌린 다음 "여름을 위하여, 바다를 위하여, 낭만을 위하여"를 소리 높여 외친 다음 다리 하나씩을 차례로 뜯어먹으면 옆자리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친구가 된다.
낙지 호롱은 식당에 앉아 주인이 구워 주는 것을 먹으면 맛이 없다. 바닷가 모래밭에 모닥불을 피웠다가 불길이 자지러질 때쯤 나무 꼬챙이 끝에 낙지 호롱을 매달아 각자가 구워 먹으면 그만한 운치는 다시 없다. 그땐 노래를 불러야 한다. 박인희의 '모닥불' 같은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 "모닥불 피워 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