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홍매의 색깔과 향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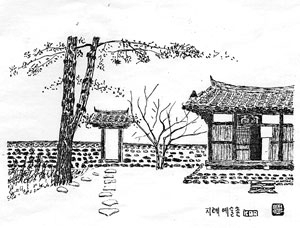
전남 승주의 선암사 홍매는 사월 초순이 지나야 만개한다. 겨울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雪中梅)는 '일생을 혹한 속에 살지만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梅香)고 한다. 늦봄에 피는 홍매는 따사로움 속에 일생을 살지만 그렇다고 향기를 파는 일은 없다.
선암사 무우전 옆 돌담에 기대고 서있는 수령 500여 년이 넘는 홍매 대여섯 그루는 자태와 색깔이 아주 아름답다. 그보다도 가람의 앞뒤 마당을 빗자루 없이 쓸고 다니는 매화 향기는 코가 시릴 정도로 향기롭다. 이곳 스님들조차 국가가 지정한 보물인 승선교, 삼층석탑, 북부도 등은 한편으로 밀쳐두고 홍매와 뒷간(해우소), 그리고 절 입구 숲길을 또 다른 3대 보물로 꼽고 있다.
오래전 선암사에 첫발을 디딘 날이 마침 홍매가 만개한 날이었다. 그 색깔과 향내의 감동은 내 감각의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은혜였다. 그 후부터 나의 남도 여행 1번지는 선암사를 비롯한 벌교 지역으로 정해졌고 요즘도 1년에 서너 차례씩 들러 선암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가 겨우 헤어나오곤 한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고매한 것을 좋아하여 매'난'국'죽을 사군자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매화를 으뜸자리에 올린 것은 자태와 품성 그리고 매향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리라. 문화유산답사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전역의 유명 사찰과 서원 등에는 매화의 기운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화엄매로 불리는 화엄사의 흑매(黑梅), 화엄사 길상암 아래 비탈에 서 있는 450년 된 야매(野梅), 백양사의 고불매, 통도사의 백매와 홍매, 산청 산천재의 남명매, 산청 예담촌의 분양매, 담양 죽림재의 죽림매, 명옥헌 원림의 명옥헌매 등 얼핏 짚어봐도 이름난 명품 매화들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절집과 정자에 있는 매화를 만나 보았지만 기억의 그물 속에 걸려 있는 것은 단 세 곳뿐이다.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선암사 홍매이며 그 다음은 산청군 단성면 운리 단속사 터에 외롭게 서 있는 정당매가 그것이다. 고려 말 강희백이 단속사에서 공부할 때 심은 매화이다. 무너진 빈 절터에 홀로 서있는 고고한 모습은 너무 애잔하여 지금도 망막 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마지막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생 두향(杜香)이 애지중지하던 매분이다. 두향은 18세 때 서른 살이나 많은 단양군수 퇴계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닌 관기였다. 두향은 학문과 예술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았다. 당시 퇴계는 두 번째 부인과 사별한 지 두 해째 되는 해였다. 매화를 가꾸는 솜씨가 비범한 그녀였으니 매화를 좋아하는 퇴계가 빠져들기엔 충분하고도 남았다.
퇴계는 짧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날 밤 두향의 치마 폭에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다'(死別己呑聲 生別常惻測)는 시 한 수를 적어 준다. 두향은 퇴계가 떠날 때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매분을 마지막 정표로 가마에 실어 보낸다. 퇴계는 숨을 거둘 때까지 20년 동안 이 매화를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애지중지한다.
두향의 분매는 얼음 같은 살결과 옥과 같은 뼈대를 지닌 보기 드문 빙기옥골(氷肌玉骨)이었다. 그 매화는 가지치기를 잘하여 등걸은 드러나고 줄기는 알맞게 구부러지면서 성깃하고 꽃은 드문드문 붙어 있는 최고의 단엽 백매였다.
이 매화를 잠시 서울에 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퇴계는 못내 그리워 손자 안도를 시켜 자신의 거처로 가져오게 한 적도 있었다. 두향의 혼이나 다름없는 아취고절(雅趣高節)의 분매를 보고 퇴계는 '원컨대 님이시여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청진한 옥설 그대로 고이 간직해 주오'(願公相對相思處 玉雪淸眞共善藏)라는 글을 짓는다. 이는 사랑할 때 나눈 운우지정을 그리워하며 두향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가 아니었을까.
퇴계는 임종 날 아침 "분매에 물을 주라"고 이르고 두향의 사랑이 꽃망울마다에 서려 있는 매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퇴계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행복한 열반이면 하루에 서너 번이라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