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개연성'필연성 긴밀히 얽혀야 훌륭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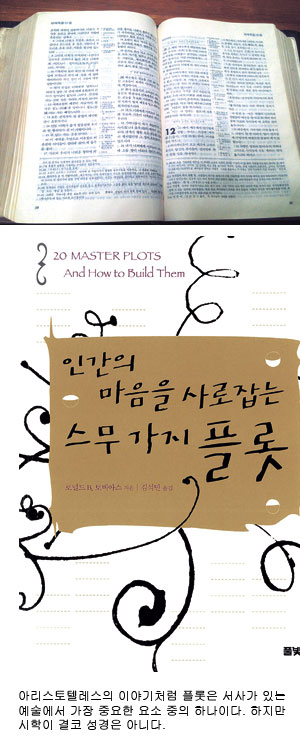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6대 요소 '플롯''성격''사고력''조사''노래''장경'을 이야기하면서 그중에서도 플롯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플롯에 대한 설명이 '시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플롯은 스토리와 다르며 서사가 있는 모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처음'중간'끝'이라는 전체성을 띤 구조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극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연극에서 영화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와 함께 가장 오래된 문학 장르인 희곡보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 수요 때문에 서점에는 시나리오작법 이론서들도 희곡작법 이론서들의 인기를 넘어섰다. 하지만 시나리오작법 이론서들을 살펴보면 영화의 기술적인 특징들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희곡작법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플롯이다.
영화의 플롯, 즉 수많은 시나리오작법 이론서들에서 말하는 플롯은 기본적으로 처음'중간'끝의 구조를 말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한 것을 1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 영화 상영시간의 적절한 배분까지도 처음'중간'끝이라는 3장 구조에 대입해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처음이 1, 중간이 2, 끝이 1이라는 1:2:1이라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분짜리 영화의 경우, 처음이 25분, 중간이 50분, 끝이 25분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히 들어온 '기승전결'이라는 구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 플롯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처음'중간'끝이라는 구조의 개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단계 '처음'은 자연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가능한(possible) 것, 즉 '가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단계인 '중간'은 앞뒤의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개연적인(probable) 것으로, 즉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 단계인 '끝'은 그전에 전개된 사건 다음에 필연적으로 오는 장면 혹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오는 종결을 뜻하는데 이는 필연적인(necessary) 것으로, 즉 '필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능성'개연성'필연성은 플롯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엉성하다면 결코 좋은 플롯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좋은 작품도 될 수 없다. 이 요소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며 긴밀하게 엮여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개연성과 필연성이 부족한 장면들로 구성된 훌륭한 작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을 삽화적 혹은 에피소드식 플롯이라고 부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최악의 구성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비극은 완결된 행동의 모방일 뿐 아니라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모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일부 연극과 영화 등에서는 삽화적 플롯을 활용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만큼 플롯도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작가들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부조리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삽화적으로 잘 구성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삽화들은 서로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삽화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대부분 숨겨져 있는데 이를 찾는 재미가 잘 완성된 삽화적 플롯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묘미다. 겉으로는 엉성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욱 치밀한 구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플롯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실력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최악의 플롯도 오늘날에는 최고의 플롯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가장 오래된 예술이론서이자 예술계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바이블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은 모방을 바탕으로 하지만 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안희철 극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