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매 향기에 취하고 굴목재의 길을 걸으며 나를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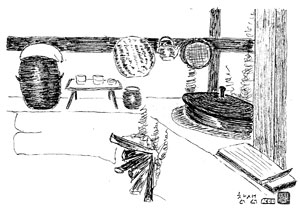
순천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산길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길'이다. 도시의 아스팔트 길 위에선 나를 돌아 볼 수 없을까마는 이 길만큼 명상에 젖어들게 하는 길도 드물 성싶다.
절에서도 참선에 드는 선방을 따로 만들어 진아(眞我)를 찾아 나서듯 묵상 순례하기 좋은 길을 걸으며 사색에 들면 이외로 자신이 만나기를 갈구해 왔던 '큰 힘'을 쉽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길을 '조계산 굴목재 길'이라 부르다가 '천년 불심길'로 바꿔 부르고 있다.
#언제 찾아가도 무던하고 매력적인 곳
나는 이 산길은 물론 벌교와 선암사를 좋아하고 자주 찾다보니 조계산 전체가 내 마음의 성소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굴목재에는 보리밥집의 밥맛이 좋아 연전에는 시산제를 조계산 장군봉 밑에서 지내기로 하고 불원천리 먼 길을 달려온 적도 있었다. 이곳은 언제 찾아가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무던한 곳이다.
조계산의 매력은 무엇인가. 물론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총림인 선암사가 이 산의 강보에 싸여 있는 것도 확실한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산의 푸른 배경이 되는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 그리고 햇볕과 계곡물이 현상 뒤의 심원에 깔려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선암사에 오면 말문을 닫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조선조 때 명문장인 김극기는'선암사'란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적적한 골짜기 안에 절/ 쓸쓸한 숲 아래 스님/ 세간 정분 다 떨치고서/ 슬기로운 물만 정히 맑게 고여 있네/ 나 여기 와서 구슬단지의 얼음을 마주하듯/ 들뜬 근심 다 지우네" 또 정호성 시인도 선암사 등 굽은 소나무 아래서 울음을 토해낸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사월이면 홍매 향 맡으러 선암사로 몰려
농담 좋아하는 스님에게 "이 절에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곧잘 듣는다. "대웅전 뒤의 홍매 향과 해우소(뒷간)의 분향(糞香)이지요." 선암사에는 승선교를 비롯하여 삼층석탑 부도 대웅전 등 등록된 보물들도 물론 많지만 무형 향기까지 보물 반열에 들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하다.
실제로 대웅전 뒤 육백 년 묵은 홍매들은 사월 초순에 만개한다. 그때 선암사 경내를 어슬렁거리면 부처님의 말씀보다 홍매 향에 먼저 취한다. 그래서 답사 전문가들도 해마다 사월이 오면 선암사의 홍매 향기를 맡으러 눈물이 나지 않는데도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곳 선암사로 몰려온다. 홍매 향 실컷 맡고 뒷간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 한 줄금 흘리고 나면 이만한 카타르시스는 세상에 없다.
#굴목재 길 걸으며 나를 돌아보다
선암사는 부처를 모시는 절이지만 이곳에는 부처보다 더 많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 주차장에서 내려 기분 좋은 흙길을 밟고 쉬엄쉬엄 올라가면 왼쪽 계곡에 있는 승선교(昇仙橋)를 만나고 그 다리 아래 계곡 바닥으로 내려서면 강선루(降仙樓)란 누각이 멋진 돔 속의 한 폭 그림으로 앉아 있다. 선암사(仙巖寺) 자체가 신선을 품고 있지만 모든 다리와 누각에는 선(仙)자가 항렬자처럼 붙어 다닌다.
이만치 살아 올 동안 나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다. 돌아봐야 걸어 온 길이 수정되거나 자갈길이 아스팔트길로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굴목재 길을 다시 한 번 걸으며 잃어버린 나를 돌아보아야겠다. 설을 쇠고 난 후 시산제를 지내기 위해 조계산에 오르고 싶다. 걷다가 지치면 굴목재 보리밥집에서 밥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옆자리에서 공양 중인 신선들에게 물어 볼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요."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