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꾸꿈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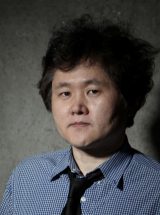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말을 건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이 짧은 문장에는 안부와 기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호의가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네는 덕담이었고, 아랫사람은 말 대신 절로 예를 갖추며 어른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른에게 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나이와 지위를 넘어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가장 일상적인 새해 인사가 됐다. 형식보다 마음이 앞서는 시대에, 언어 예절 역시 그렇게 변해왔다.
문제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상당수가 오래된 관습과 믿음을 별다른 의심 없이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한때 말로써 행동을 제약하던 표현들은 적지 않았다. "방 문턱에 올라서지 말라"는 말에는 넘어질 위험을 막고 집을 보호하려는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문지방을 경계로 복과 액운을 나누던 믿음도 스며 있다. "생쌀을 먹으면 부모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말 역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귀한 식량을 아끼고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속설이었다. 말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오늘의 언어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이들 놀이에서 쓰이던 "앞에 가면 도둑놈, 뒤에 가면 순경"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장난스러운 언어유희였지만, 오늘의 감각으로 들으면 누군가를 쉽게 규정하고 낙인찍는 말로 읽힐 수 있다. 말은 늘 가볍게 시작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남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시대가 달라지면 언어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인 동시에,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습관과 언행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습관처럼 쓰던 말 속에 편견이나 선입견, 불필요한 혐오는 숨어 있지 않은지,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을 바꾼다고 세상이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말이 쌓여 태도가 되고 태도가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일수록, 그 말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작동한다.
올해의 첫 인사는 조금 느긋해도 좋겠다. 꼭 정해진 형식이 아니어도, 화려한 덕담이 아니어도 괜찮다. 상대를 배려하는 한마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심해 고른 표현 하나면 충분하다. 새해에는 복을 부르는 말을 애써 찾기보다, 서로의 일상에 복이 머물 수 있는 말을 천천히 건네는 한 해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