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꾸꿈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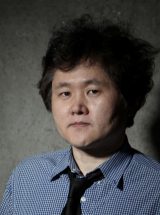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요즘 미술 전시장에서는 작가의 작품 대신 책, 특히 사진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전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전시장 문을 열면 벽에는 사진 대신 책이 펼쳐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책은 이제 '읽는 대상'을 넘어 하나의 오브제이자 예술 작품으로서 새로운 전시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 뮤지엄한미의 '포토북 속의 매그넘', 부산 도모헌의 '슈타이들 북 컬쳐' 특별전 등 주요 사진 축제에서도 사진책 전시는 이제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됐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책은 아트북이나 그래픽 디자인 부스에서만 다뤄졌고, 사진 전시는 벽에 작품을 걸어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책 자체가 전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책은 사진가가 자신의 세계를 가장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매체다. 몇 장의 사진만으로는 전하지 못하는 맥락과 서사가 한 권의 책에 녹아 있으며, 관람객은 책장을 넘기며 작가의 시선과 호흡을 천천히 따라간다. 그래서 사진책 전시는 단순히 책을 진열하는 것을 넘어, 작업 과정의 도구와 스케치, 소품, 굿즈까지 함께 전시되며 책 속 세계가 전시장으로 확장된다. 벽에 사진을 거는 것보다 훨씬 세밀한 기획력과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책·작품·공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활발한 만큼 시행착오도 뒤따른다. 일부 전시는 책보다 굿즈 판매나 화려한 연출에 치중해 본래의 의도가 흐려지기도 한다. 책은 구석에 밀려난 채, 공간은 캐릭터 상품과 포토존으로 가득 차 서점인지 전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책보다 장치가 앞세워지며 본말이 뒤바뀌는 셈이다.
그럼에도 사진책 전시가 지닌 가능성은 크다. 사진책은 작가의 시선과 사유가 가장 밀도 있게 담긴 결과물이자, 관객이 손끝으로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통로다. 전시 기획자가 공간과 책, 그리고 굿즈의 비중을 균형 있게 조율한다면 사진책 전시는 작가와 관객이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 안에서 책은 상품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깃든 작품으로 자리매김한다.
책은 이제 읽히는 것을 넘어 전시의 무대가 되고 있다. 사진책 전시는 사진 예술의 경험 방식을 확장하며, 관객에게 새로운 감상의 지평을 연다. 책장을 넘기듯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작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들의 세계를 만난다. 사진책 전시는 하나의 흐름을 넘어, 사진 예술의 감상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