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애 교육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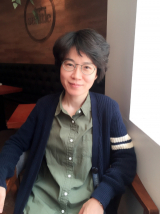
가을은 문화 예술의 계절이다. 가볼 만한 전시가 대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가을에는 농부들만큼이나 미술가의 마음도 넉넉하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연인과 팔짱 끼고 미술관으로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덩달아 신난다. 이들이 여유롭게 미술을 만끽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미술의 이해는 미술교육의 책임이다. 미술교육이 제 할 바를 다해야 미술의 이해가 바르게 이뤄진다.
미술과 미술교육, 비슷한 듯 다른 말이다. 전자는 주로 시각적인 것과 연관된 예술을 가리키고, 후자는 전자의 의미와 교육의 의미가 합해진 것을 가리킨다. 이 둘은 달걀과 닭의 관계와 사뭇 닮았다. 미술교육을 받은 미술가는 작품을 창작하고 미술가가 창작한 작품은 미술교육의 좋은 소재가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술과 미술교육의 세계는 분리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과 구분이다. 미술학과(서양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등 세부 전공으로 분리된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와 미술교육학과는 분리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술교육학과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에 설치된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사를,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통 미술 교사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출신이거나 미술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한 사람이다.
하지만 미술학과의 교직 이수 자격을 얻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또 용케 그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교직 이수자는 1학년 성적으로 선발하고 인원은 전공당 1명이다. 말하자면 그 전공에서 제일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만 자격을 준다. 속된 말로 점수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이 쉽지 않다.
1990년대 반짝 일부 사범대학의 미술교육학과가 미술학과로 변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조차 힘들다. 취직률이 학과 평가의 주요 점수가 되기 시작한 이후 미술교육학과 주가가 솟구쳤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미술학이든 미술교육학이든 미술과 교육의 일을 진지하게 다루고, 미술가와 미술 교사 어느 쪽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물론 학문의 심층적 탐구는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술학과를 나온 사람만 미술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더욱이 미술교육학과를 나온 사람만 미술교육에 종사하지도 않는다. 미술과 미술교육 모두에 몸담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은연중에 미술과 미술교육을 분리하고, 미술가와 미술교육자를 구분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왜곡하는 일이다. 대학 은사인 고 이동진 교수님은 모두의 개성이 존중받는 미술만큼 평화로운 세계는 없다고 하셨다. 하물며 취업률로 미술과 미술교육의 우열을 가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만약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면 그 점을 이 가을에 꼭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