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천 황현(독립장)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자결 순국했다.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그는 1883년 고종 때 과거에서 수석 합격했으나 시골 출신이라며 차석으로 밀려나자 조정의 부패를 절감하고 귀향했다. 마침내 망국 뒤 "인간 세상 지식인 노릇 어렵다"는 절명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는 망국의 현장 기록인 『매천야록』에서 옛 조선 신분제도를 증언했다.

"우리나라 신분제도는 문벌을 정한 품계가 있었으니 서울이 더욱 심했다. 사대부(士大夫)는…관직을 생업으로 하고, 중인(中人)은 하나의 계급을 이루어 역관을 생업으로 하며, 상사람(常漢)은 상업과 심부름꾼 그리고 노비를 이룬다. 오직 중등과 하등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니…대대로 그 업을 이어갔으며…공사천역(公私賤役)들은 모두 상사람들이 맡았다. 이러한 제도는 수백년을 내려오며 뚜렷하게 존재하며 서로 섞이지 않았다.…"
옛 조선은 신분사회였고,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는 겉으로는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했다. 그러나 신분제는 독립운동의 전쟁터에서 붕괴됐다. 사대부와 상한은 독립전쟁을 위해 신분제를 허물어야 했다.
◆신돌석·안규홍 등 의병장 우뚝

의병전쟁에서 이들 상한의 활약 사례는 많다. 1894년 시작된 의병전쟁에서는 대체로 양반 중심 의병장이 의진(義陣)을 꾸렸던 만큼 평민과 노비, 머슴 출신 의병장은 드물었다. 그런 흐름속에서 경북 영해의 평민 출신 신돌석(대통령장)과 전남 보성의 담살이(머슴) 출신 의병장인 안규홍(독립장)은 신분의 벽을 넘은 대표 사례가 될 만하다.
두 의병장은 낮은 신분에도 항일 활동이 뛰어난 만큼 오늘날도 공적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돌석 의병장 이후 양반 계층이 아닌 농민 출신 김수민(독립장)·안규홍 의병장 등의 등장도 이뤄졌다는 평가이니 신분제 철폐는, 토지개혁이 6·25전쟁에 국민 동참을 이끈 것처럼 의병전쟁에 기여한 셈이다.
과거 좋은 가문 집안의 신돌석은 중인(평민)으로 몰락해 갓도 쓸 수 없었지만 '태백산 호랑이'로 불릴 만큼 용맹을 떨쳤다. 울산 양반 출신 박상진(독립장)과는 1906년 의형제도 맺었다. 의병사에 이름을 남긴 그런 신돌석도 상금에 눈이 먼 동포에게 암살당해 1908년 삶을 마쳤다.

안규홍 의병장은 배우지도 못한 담살이였지만 일본군에 맞서 대첩(大捷)의 공을 세우고 대구감옥에서 1910년 6월 22일 사형으로 순국했다. 특히 유족은 사형 소식을 1911년 5월 11일 통지받고, 시신을 12년 지난 1923년 2월에야 운구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의 시신 반장(返葬) 사연은 대구 사람의 배려와 350여 고향 사람의 십시일반을 기록한 『대구반장시부의록』에 남아 전한다.
◆군자금 제공·군의관 활동 등 다양
함경북도 경원 태생으로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일군 재산을 안중근(대한민국장)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지원 등 독립운동에 쓴 인물이 최재형(독립장)이다. 그는 머슴살이를 견디며 상업으로 신뢰를 닦아 가난을 벗고 큰 부를 쌓았고, 이를 독립운동 밑천으로 삼아 독립군자금을 대는 등 활약으로 이름을 빛냈다.

과거 남다른 천인 취급을 받은 백정(白丁)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나 1908년 제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 외과의사(醫師)가 된 박서양(건국포장)의 신분해방 운동과 독립운동도 평가받을 만하다. 1911년 한국인 최초로 백정 출신 교회 장로가 된 아버지(박성춘)에 이어 박서양은 주변의 편견을 이기고 학생을 가르치며 신분 해방과 차별 철폐에 앞장섰다.
박서양은 특히 1917년 중국 길림에서 구세의원을 열고 교회와 학교도 세웠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국민회 군사령부 군의관으로 활동했고,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에도 종군했다. 무료진료 등에 따른 재정 압박과 일제 탄압, 1932년 터진 윤봉길(대한민국장)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폭탄투척 의거 이후 학교 폐교로 귀국, 선대 고향인 황해도에서 병원을 열어 운영하다 1940년 삶을 마쳤다.


천인 취급에 도성(都城)인 한양 출입 제한과 양반의 핍박에 시달린 불교계 스님의 독립운동도 기릴 만하다. 임진왜란 승병(僧兵)처럼 독립운동의 의승(義僧)도 많았다. 1919년 3월 만세운동 참여와 옥중 순국, 독립군자금 제공 등 다양하지만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
먼저 1919년 3·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인 백용성(대통령장)한용운(대한민국장) 스님이 있다.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김동삼(대통령장) 애국지사 시신도 거둔 한용운 스님은 1912년 만주에서 밀정으로 오해받아 한인 청년의 5발 총탄을 맞고도 살아났으며, "독립용사의 5개 탄환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죽어도 유한이 없다"고 한 일화가 김구(대한민국장) 주석 등에 의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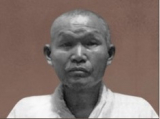
백초월(애국장) 스님은 1919년 4월 꾸린 비밀단체 단장으로 임시정부 및 독립군 지원, 군자금 모집, 의용승군(義勇僧軍)조직 등으로 징역 3년형으로 청주형무소 수감 중 1944년 순국했다. 제주도에서는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애족장)·김인수(애족장) 스님과 제주 출신 강창규(애국장)·방동화(애족장)·김상언(애족장) 스님 등이 신도들과 1918년 항일 무력시위를 벌여 투옥되는 고통을 겪었다. 대구 동화사에서는 김문옥(애족장) 등 10명의 학승이 1919년 만세운동으로 수감됐다.

그런데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서울 진관사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26일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때 쓴 것이라는 태극기와 당시 『독립신문』 등이 발견됐고,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는 지난달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다른 천인인 산척(山尺) 즉 사냥꾼(포수)의 항일 독립운동은 홍범도(대한민국장) 장군 등 포수들로 조직한 의진(義陣)의 투쟁이 있다. 역시 기생(妓生)의 활약도 빠뜨릴 수 없다. 의기(義妓)나 사상(思想)기생 등으로 불린 어재화(서울)와 강국향(군산), 현계옥·정칠성(대구), 김향화(수원·대통령표창) 등의 활동 사례가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