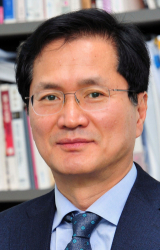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어젠다였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죽은 권력'에 칼을 대던 시절에는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힘을 잔뜩 실어줬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주문한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숨죽어 있던 '검찰개혁' 어젠다를 다시 깨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개혁'이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산 권력을 보호하려는 정권의 의지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렸을 뿐이다.
개혁으로 포장한 이 정부의 검찰 와해 시도는 치밀하고 집요했다. 전국 지검 지청의 특별수사부는 폐지됐다. 부패·경제 범죄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별도로 설치됐다. 라임펀드를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졸지에 해체됐다.
권력에 드러눕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인사권 행사는 필수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검사는 어김없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참여정부 때 만든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은 철저히 무력화됐다.
그래도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정보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던 공소장 공개도 막아버렸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 증언 감정법' 규정은 짓밟혔다.
검찰 독립의 상징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직무정지, 징계 청구도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더니 검찰총장이 물러서지 않자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검수완박이 곧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을 우려한 총장이 물러났다. 수사 라인은 완벽하게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중수청 설치는 흐지부지됐다.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은 개혁됐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갔고, 공수처는 설치됐다. 이쯤 되면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오로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철저히 유지하며 수사 중"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는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는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은 없다. 검찰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싸고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유동규 구속 시 배임 혐의 누락, 도피성 출국 후 입국한 남욱 변호사 영장 불발 등이 검찰이 보여준 실력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제사(대장동 게이트)보다 젯밥(윤석열)'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검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다"고 했다.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다. 이는 검찰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집요했던 검찰 와해 시도 결과의 진면목을 보고 있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