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급감 + 코로나19= 위기 가속화
정부지원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 심화
지방대학의 역할 '고민' 과감한 혁신 요구
대학 혁신 없는 정부지원은 낭비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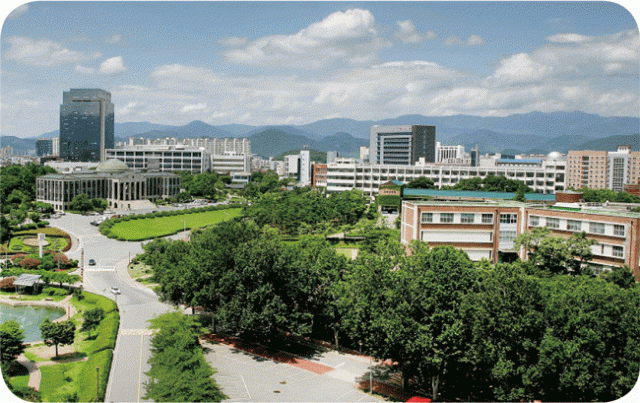

지방대학들이 아우성이다.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41만4천126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 정원보다 7만8천326명이나 적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서울과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부족 인원 대부분은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로 귀결될 전망이다. 더욱이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2024년 38만명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더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극심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게다가 13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로 지방대학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방대학의 빈 공간을 채웠던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외국인 유학생들조차 끊겼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을 지방대학들은 맞았다.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지방대학들은 '정부재정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이 지방대학은 평균 121억원인데 비해 수도권 대학은 225억원에 이른다.
연구개발사업의 대학당 지원액도 지방대학은 52억원으로 수도권 대학 149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지방 4년제 대학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액은 91억원이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은 236억원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지식'이 성장과 발전의 동력원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로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고, 지방균형 발전의 동력원은 지식의 창출과 교육을 맡은 지방대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망한다는 것은 지방이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생존'은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조건'일뿐이다. 중앙정부지원에 의해 지방대학이 '연명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방대학들은 그 지방의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생존의 목줄을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지방대학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革新)이 요구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필자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전국의 대학(전문대 포함)은 100개 미만이었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각종 대학은 모두 417개로 조사되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증가한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학들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대학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상아탑'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

또한 상당수 지방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교수 요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독립적 연구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실현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수와 교직원 등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의 포기 또는 반납'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남고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지방대학 구성원의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고, 살아 남은 대학들(전공 및 학문 분야)은 '제한된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방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아 도는 대학 캠퍼스 공간과 인력은 지역민들의 혁신과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최소한 20~30년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왔다. 그동안 이런저런 논의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현재의 '참담한' 모습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구성원이 가진 기득권과 타성을 스스로 버리기란 그만큼 어렵다.
혁신(革新)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누가 스스로 원할까? 혁신(革新)은 죽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지방대학은 그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살아남을 것인가,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냉엄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
지방대학 구성원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득권을 가진 존재였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생존하고 지방(지역사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이미 나라의 곳간은 비었다. 그냥 아우성친다고 나눠줄 나랏돈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