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경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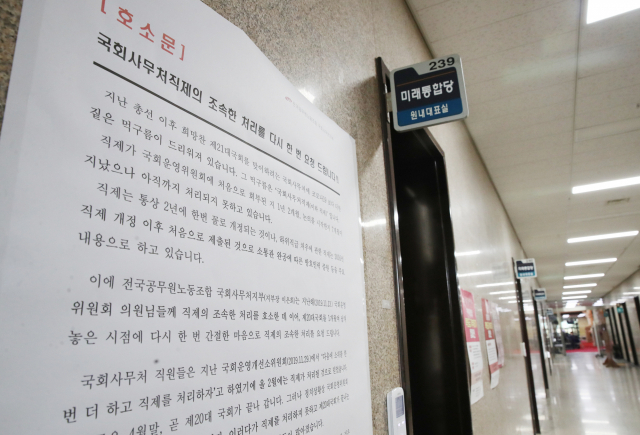

지난주 초까지 계속된 미래통합당의 내홍은 총선 참패 후 질서 있는 퇴각으로 후일의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곧 물러날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정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애면글면한 게 사달의 시작이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비대위로 간다면 누구를 대표로 내세울지, 조기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꾸릴지는 21대 국회 새로운 당선인들이 결정하도록 맡겼어야 한다. 반성과 수습은 고사하고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보수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비대위 문제 등 당의 진로는 8일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포함해 21대 당선인들에게 맡겨졌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했으니 당연히 새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당선인들이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은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다. 벌써 40대 대선 주자 운운하는 것은 당내 갈등부터 부르는 성급한 김칫국이다. 난파된 배를 수리하기도 전에 선장부터 내정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향후 그려야 할 보수의 청사진은 한마디로 "정체성 확립은 분명하게, 정책적 대응은 유연하게"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영국 보수당은 1945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에 참패한다. 1935년 총선에서 얻은 432석의 절반도 안 되는 213석에 그쳤다. 보수 대학살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2차 대전 전쟁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었지만 국민은 이들을 외면했다. 전쟁 후 국민의 요구가 달라진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 결과였다.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국민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비전이 제시되었지만 보수당은 그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사회주의로 터부시했다.
선거 참패 후 보수당은 비로소 시대의 흐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1947년 발표한 '산업헌장'에서 보수당은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 노사 간 협력 인정, 국가보건서비스(NHS) 설립 등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수용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청년보수운동과 재정 및 당 후보 충원 구조 개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중·하류층 출신이지만 나중에 쟁쟁한 보수당 총리가 된 에드워드 히스, 마거릿 대처, 존 메이저 등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귀족적 정당에서 탈피한 보수당의 개혁 덕분이었다. 향후 20년은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자조했던 보수당은 1951년 정권 탈환 후 1964년까지 장기 집권 시기를 구가하게 된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가. 여당의 실정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야당을 외면한 것은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보수 세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수정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긴급재난구호금 얘기가 나왔을 때 재정건전성을 들고 나온 것은 당장 굶고 있는 국민에게 나중에 있을 잔치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도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보수주의란 모든 변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시대적 유행이나 사고방식에 저항하며 사회적 균형을 잡는 것이다." 영국 보수당이 경제·사회정책 등 현안에 대해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노동당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데는 이 같은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보수당은 정책적 유연성과 별개로 보수주의의 이념적 정체성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당을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말하는 이념적 정체성은 완고한 고집으로 느껴지기 쉽다. 국민들에게 왜 보수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지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국민에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영국 보수당이 밝힌 보수의 정체성이 우리나라 보수의 정체성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