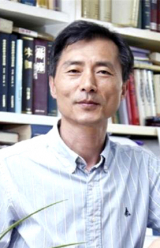
'희망가'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는 구절도, 신흥종교 '이불교'에서 왔다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도 왠지 새롭다. 불안 속에서 왜 희망, 구원 같은 말에 빠져드는지 알 만도 하다.
공적 마스크 배급도 못 받고 칩거 중, 며칠 전 함성호 시인이 보냈던 문자를 본다. 글쎄, 다른 말은 없고 달랑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시 한 편뿐. 그래도 고마워서 새겨 읽는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로 끝나는데,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라는 대목에선 멈칫한다. '가르마'는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으로, 길을 은유한다.
'내 졸음의 통통배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멀어져 간다.(…)/ 밖에는 바람 많아 배가 못 뜬다는데/ (…)나는 이렇게 환한 자부럼 사이로 물길을 낸다'며 김사인은 시 '목포'에서 말했다. 배가 못 뜰 때는 졸음 사이라도 '물길'을 쳐다보는 법이다. 남인수는 1942년 '낙화유수'를 불렀다. "이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세월의 꿈을 실어 마음을 실어/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 일제강점기의 암흑에도 꽃 같은 삶을 생각하며 '고개를 넘자'고 했다. 언제나 '길'은 희망의 부표로 꿈-기획이며, 미래를 뜻했다. 반면, 기억은 회상-추억이며, 과거를 말했다. 삶은 늘 우리를 속이나 '기억'과 '희망'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헤맨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이 작금의 일상이다.
코로나19로 대구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편하다. 폐렴-신천지-대구-보수-위험-골치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합체해 '대구 사태'로 요약해서 '손절'하잔다. 손절이란 '손해를 끊어버리는 매매'이다.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른 '차별→코호트'의 전략적 마타도어이다. 가증스럽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제나 싸구려 입들은 권력에 기생충처럼 빌붙어 우아한 척 프로파간다로 썩어갔다. 앉아 있어도 가벼운 두뇌는 권력에 치달아 '좌치'(坐馳)한다.
이럴 때 '길 도'(道) 자를 떠올린다. 자꾸 '머리'가 어른대서 그 나름 불온한 글자다. '쉬엄쉬엄 걸을 착'(辶) 자 위에 얹힌 '머리 수'(首). 전쟁 때 베어서 쥔 적군의 머리[首級]인가. 고대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 적장의 목을 장대 끝에 걸고 전진하는 비장한 행군이었다. 정치도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일이다. 잘해봤자 3류다. 거기에 희망을 몰방(沒放)하는 관종들은 5류 이하가 아닐까. 아둔한 송나라 사람이 벼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고갱이를 쑥쑥 뽑아놓는다는 송인알묘(宋人揠苗) 대목에서 함석헌은, "세상 정치가 곡식 고갱이 뽑는 짓 아닌 것이 없지!"라고 쿡 찔렀다.
다른 데선 더 비꼰다. "천하에 정치한다는 것들 제(齊)나라 놈같이 제 처, 제 첩들이 몰래 울지 않을 것들 없지!"라고. 어느 시대나 정치 수법은 비슷했다. 민초들의 생명 그 고갱이를 쑥쑥 뽑아놓고는, 곡비(哭婢)라도 불러 속을 다스려도 모자랄 판에, 거기다가 거듭 비수를 꽂아 피눈물을 쏟게 한다. 그래 봤자 세월 가면 다 끝난다. "(다른 사람들은) 선배와 스승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무덤이라는 것만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다"던 노신(魯迅)의 말에 끌린다. 이어서 말한다. "누가 안내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달려 있다"고. 살다가 저 무덤까지 '가는 길'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닐까. 문제는 '어떻게' 갈 건가이다.
살면서 각기 제 무덤을 판다. 능력·전문이니 하나 사실 그 '잘난 것=잘하는 것'이 곧 무덤 파는 기술이다. 그런 공적·깜냥의 크기에 그것도 제 발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묻힌다. 물론 못난 자들은 콩밥 좀 먹고 업보를 세탁하는 특권(?)도 있긴 하다. 다시 묻지만, 이 풍진 세상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냥 울고 웃으며, 사람답게 사는 일상이 그립지 않은가.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