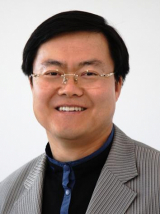
성석제의 소설 '처삼촌 묘 벌초하기'는 처가 문중 땅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속담과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형상화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문중 어른들과 선산을 둘러보겠다는 처남의 전화를 받고 처가 직계 자손인 처삼촌 묘를 구슬땀을 흘려가며 벌초를 했다. 하지만 선산 방문을 뒤로 미룬다는 처남의 전화에 허탈감에 빠진 채 몸살로 드러눕는다.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란 속담이 있다.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처가는커녕 자기 집안 조상들의 산소 벌초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세태가 되었다.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마뜩잖아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우거진 산림을 헤치고 산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농사일에 문외한인 젊은 세대들은 풀베기조차 낯설다. 예초기가 보급되었지만 조작이 서툴고 사고 위험성도 높다. 벌에 쏘이기 쉽고, 뱀에 물릴 수도 있다. 이래저래 다치거나 풀숲에서 얻은 감염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번 대행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 풀의 성장이 멈추는 추석 전 보름간은 벌초의 적기이다. 추석 성묘를 위해서도 벌초는 필요하다. 하지만 조상의 묘를 살피고 돌보는 이 국민적 풍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산야가 변했고, 장례문화가 변했고, 후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세상만사 주변 환경과 시절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짙은 산림에서 풍수지리를 논하기도 곤란하고, 도로변 전답을 죄다 무덤으로 만들 수도 없다. 조상들도 귀한 후손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낫질도 못하는 신세대에게 산중 벌초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벌초는 물론 제사와 전래의 풍습에도 그다지 호감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인 이유도 없지 않다. 이제는 매장보다 화장이 대세이다. 인생의 육체적인 결말은 한 줌의 흙이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상의 묘소 또한 예외가 아닐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