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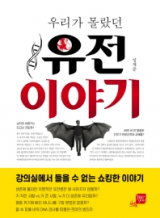
모든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지며 그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 유전자는 생물 자신의 형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전달되어 후손의 형질 결정에도 참여한다. 생물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거의 필사적으로 후손을 낳아 기르며 후손의 번성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것 같지만 생각하기 따라서는 유전자가 생물 개체를 조종하여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후대에 전달하도록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물이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며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생물체를 '유전자의 노예'라 부르기도 한다.
30년간 대학에서 유전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계준 교수는 일반인에게 쉽고 흥미진진한 유전학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복잡한 DNA 구조나 어려운 용어 설명 대신 흥미롭지만 꼭 알아야하는 유전학에 대한 22가지 이야기를 풀어냈다.

◆남자의 바람기와 여자의 바람기
남녀의 사랑과 결혼은 궁극적으로 2세를 낳아 자신이 가진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동물적인 발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후세인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정확히 절반씩 소유한다. 후세를 생산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데 있어서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원시 인류사회는 모계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육아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여성이 거의 다 짊어졌다. 지금도 인류의 유전자 속에는 모계사회에 적응된 유전자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모계사회 남성은 사귀는 여성이 많을수록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는데 유리하다. 반면 여성은 자신이 임신하고 또 출산 후에도 육아를 책임지게 되므로 평생 낳게 되는 자녀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튼튼하고 강한 그리고 지혜로운 남자를 선택하여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한다. 여성은 강한 남성을 선택했지만 더 강한 남성이 나타날 경우 이전의 남성을 버리고 새로운 강자를 선택할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

◆일벌, 알고 보면 아주 이기적 존재
일벌은 여왕벌의 뒷바라지를 하고 먹이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집짓기, 집안 청소, 동생이 되는 새끼를 기르는 일 등 둥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여왕벌이 최대한 많은 2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군집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꿀벌 집단의 일벌이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과 집단을 위해 희생한다고 칭찬해왔다. 그런데 일벌의 자기 희생을 유전적으로 분석해보면 결코 자기희생이 아니며 유전자를 후대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왕벌과 일벌은 아비와 어미로부터 각기 한 조씩의 염색체를 물려받는 2배체이다. 반면 수벌은 아비가 없이 어미로부터만 한 조의 염색체만 물려받는다. 일벌이 산란해 후세를 생산할 때와 영왕벌을 도와 동생을 생산할 때의 유전자 비율이 다르다. 일벌 자신이 직접 알을 낳아 일벌을 생산할 때 유전자 동질성은 50%지만 여왕벌을 도와 낳은 동생 일벌의 유전자 동질성은 75%로 높게 나타난다.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일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여왕벌을 이용하는 셈이다.

◆꽃은 피어도 씨앗 맺지 못하는 상사화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여 상사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큰 꽃을 많이 피우지만 단 한 알도 종자를 맺지 못하는 게 더욱 슬프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자를 맺어 번식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사화는 왜 종자가 맺지 않을까? 상사화는 3배체 식물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식물은 염색체가 두 벌이고 이들이 감수분열을 할 때 상동염색체끼리 짝을 지어 분리된다. 3배체 식물은 염색체가 세 벌씩 존재하므로 서로 짝을 맞출 수 없어 생식세포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생식세포 형성이 안 되니 씨앗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사화는 어떻게 번식할까. 그 비밀은 무성생식에 있다. 종자는 맺지 못하지만 알뿌리가 계속 불어나서 번식이 가능한 것이다. 무성생식으로 번식한 식물은 복제식물이 되며 유전적으로 동일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된다.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된 식물은 병충해에 취약하다.

◆제정 러시아 멸망케한 혈우병 유전자
혈우병은 상처에서 피가 멎지 않는 치명적인 유전병이다. 유럽 왕가에 혈우병이 나타난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시기였다. 유럽 왕가에서 혈우병 유전자를 맨 처음 가진 사람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4남 5녀로 9명의 자녀를 두었다. 자신은 보인자로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아들 1명은 혈우병, 딸 2명은 보인자로 자손에서 혈우병이 나타났다. 혈우병 보인자인 둘째 딸 앨리스의 손녀 알렉산드라는 후에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의 차르 니콜라스 2세와 혼인하여 러시아 왕실에 혈우병을 퍼뜨렸다. 알렉산드라는 내리 4명의 딸을 낳고 다섯 번째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았다. 당시 러시아는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이 허용됐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외동아들은 치명적인 유전병인 혈우병을 안고 태어났다. 왕자의 혈우병은 황실의 가장 큰 우환이었다. 왕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왕후는 결국 미신과 영적인 힘에 의존하게 되고 정교 승려 라스푸틴을 믿고 권력을 맡겼다가 결국 국정을 농락해 제정 러시아 몰락을 가져왔다. 274쪽 1만6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