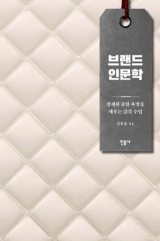
우리는 왜 특정 브랜드에 끌리는 걸까. 이 책은 내 취향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살피다보면 나의 무의식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우리 손이 운전대를 잡으면(운전대와 접속하면) 운전하는 손이 되고, 지휘봉을 잡으면 지휘하는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으면 악수하는 손이 된다" 며 "운전자인지 지휘자인지, 친구인지 하는 정체성은 내 손 자체에 있지 않고, 접속과 배치를 통해 확인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잡고 싶어 하는 지는 전적으로 나를 자극하는 대상과 내 욕망이 좌우한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나의 욕망이자 취향이며, 정체성이다.
◇ 초기 브랜드는 메시지였다
브랜드(brand)의 그리스 어원은 '스티그마(stigma)로, 칼끝으로 긋거나 뾰족한 바늘로 찌른 '자국, 점, 표시'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문신-타투'에 가깝다. '문신=브랜드'라고 할 때 최초의 브랜드는 메시지였다. 기원전 5세기에 나타나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자.
'히스티아이오스는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반란을 꾀하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검거돼버렸다. 그래서 그는 가장 충직한 노예의 머리를 깎고 살갗에 문신을 한 뒤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머리카락이 자라자 그는 종을 보내며 "도착하거든 아무 소리 말고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저의 머리를 깎고 살갗을 살펴보소서' 라고 말 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몸에 새긴 이 자국은 '타투 레터링',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 문신은 정체성이자 '굴레'
브랜드는 신분표시이기도 했다. 당시 죄수, 전쟁포로, 노예는 신체에 문신이 새겨졌다. 때로는 소유주를 알리기 위해 가축에게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사제들은 특별한 문신을 새겨 자신들이 신에 속해 있음을 과시했고, 군인들은 손에 문신을 새겨 자신이 군인임을 드러냈다.
브랜드가 메시지, 신분, 소속을 의미한다는 것은 문신이 특정인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음을 알려준다. 노예의 살갗에 새겨 반란을 지시한 문신은 그 노예가 특사임을 가리키고, 사제나 군인의 문신은 그들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신, 즉 브랜드는 그것을 새기고 있는 사람의 소속과 사명감, 의무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수단이었다.
물론 문신은 '낙인', 즉 '주홍글씨'가 되기도 했고(죄를 지은 사람들), '인간의 굴레'가 되기도 했다.
◇ 은을 새겨 넣은 금 고리의 의미
브랜드가 명품, 즉 소중한 물건이라는 의미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기원전 10세기,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썼다고 전해지는 '아가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에 '스티그마'가 나타난다.
"우리가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은을 새겨 넣어 당신에게 주겠소." 여기서 금 고리는 그냥 금고리가 아니고, 은이 새겨진 금 고리이다. 즉 금 고리에 은을 '새겨 넣음'으로써 평범한 금고리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특별한 물건이 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스티그마(브랜드)'는 '새겨 넣음'을 의미한다.
지은이는 "이 번역본이 기원전 3세기경에 있었다고 하니, 적어도 이 시대부터 오늘날 브랜드의 의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상인들이나 석공들이 자신들의 상품에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브랜드가 상품 값을 톡톡히 해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브랜드로 보는 자신의 욕망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는 우리 내면에 잠든 과거를 잠재력이라고 불렀다. 이 잠재력은 자극을 받으면 깨어난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브랜드는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지은이는 "특정 브랜드와 접속해서 생기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잠재력이 현실화 된 것이다"고 말한다.
물론 이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욕망은 그 브랜드와 나의 눈길이 마주치면서 일어난다. 이 책은 브랜드가 우리의 감각에 던지는 어떤 파장과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범주화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신체와 감각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동시에,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의 본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 무취향이 사치를 부른다
내면에 든 욕망을 확인하고,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는 것이 사치를 부르는 것은 아닐까.
지은이는 "자본에 의한 문화의 평준화는 무취향을 만든다. 그것이 후기 시민사회의 골칫거리인 사치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취향을 모르니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음에도) 남들이 가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야 하고, 비싼 것일수록 고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그것은 대중문화가 아니라 '무취향'의 사치이고 하류문화"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것,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음에도 명품이기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것 등이 사치이고 하류문화라는 것이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정체성에서는 프라다, 지방시, 비비안웨스트우드, 발렌시아가, 아마존을 다루고, 2부 감각과 욕망에서는 스타벅스, 베르사체, 알렉산더맥퀸, 베네통을 다룬다. 3부 주체성에서는 샤넬, 페라가모, 구찌, 랑방, 로얄코펜하겐, 레고를, 4부 시간성에서는 티파니, 랄프로렌, 까르띠에, 스와로브스키, 디즈니, 몽블랑을, 5부 매체성에서는 버버리, 갈리마르, 민음사, 리바이스, 펭귄북스를, 6부 일상성에서는 이세이 미야케, 아르마니, 크리스챤디올, 알레시, 루이비통, 입생로랑을 각각 다룬다.
▷ 지은이 김동훈
인문학자다. 서울대 서양고전학협동과정에서 희랍과 로마 문학 및 로마 수사학을 공부했다. 현재 고려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플라톤과 키케로를 연구하고 있다. '별별명언: 서양 고전을 관통하는 21개 핵심 사유'를 출간했다. '몸젠의 로마사', 장 보댕의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 희랍어, 라틴어, 히브리어 텍스트를 번역했고, 그리고 '세계시인선'에서 히브리어 및 라틴어 원문인 '욥의 노래'를 번역했다.
486쪽, 1만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