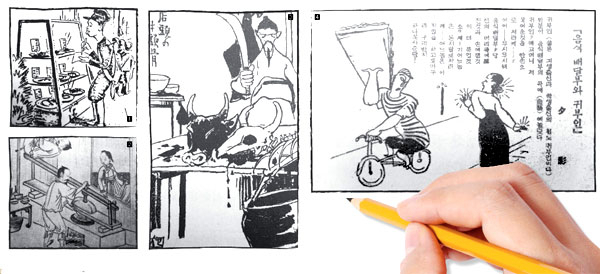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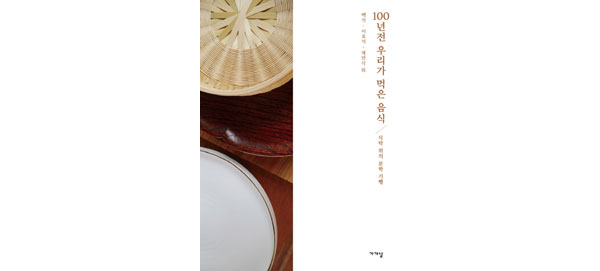
100년 전 우리가 먹은 음식/백석'이효석'채만식 외 지음/가갸날 펴냄.
텔레비전엔 온통 요리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말일 것이다. 거리로 나서면 각양각색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냉면을 맛볼 기회가 없었다. 냉면은 관북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고, 1920년 이전에 경성(서울)에는 냉면집이 없었다.
외식이 현대인에게는 일상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외식'은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197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신이 사는 마을을 벗어날 일이 없었다. 식사는 으레 집에서 하는 것이었다. 여행자도 외식문화도 없으니 음식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근대적 의미의 음식문화가 태동하던 20세기 초의 요리와 식당, 음식문화를 문학작품을 통해 들여다본다. 당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 요리나 요릿집을 등장시켰다. '100년 전으로 떠나는 음식 문학기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성에 냉면집이 생긴 것은 1920년대
최초의 요릿집이 문을 연 것은 1910년 무렵이었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우후죽순 음식점과 선술집이 생겨났다. 때를 같이하여 냉면, 설렁탕, 추어탕, 군고기, 떡국, 만두 등 민초들이 사랑하는 대중요리가 등장했다. 1910년대에 이르자 관북지방 사람들이 즐겨먹던 냉면이 평양에 들어왔고, 1920년 무렵엔 경성에도 냉면집이 생겼다. 1920년대 중반 서울 전동의 대구탕 집을 시작으로 고기를 음식점에서 구워 먹는 문화가 번지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 무렵 음식 배달부도 등장했다. 1920년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음식문화 혁명의 격랑에 휘둘렸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보수와 개혁이 충돌하고 일합을 겨루었다. 마침 당시는 근대문학이 여명기에서 중흥기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숱한 문인, 문사들이 그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던 장면을 소설로, 수필 형식으로, 르포르타주로, 기사로 담아냈다. 백석, 이효석, 채만식, 방정환, 김랑운, 현진건, 김유정 등이 문학작품으로 그 현장을 묘사했고, 구본웅, 안석영, 나혜석 등은 그림으로 그렸다.
◆내장을 긁어내어 싸리로 목줄띠를 꿰어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김상용은 봄날에 명월관에서 교자 먹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다.
『두어 고팽이 '복도'를 지나 으슥한 뒷방으로 들어서거든, 썩 들어서자 첫눈에 뜨인 것이 신선로. 신선로에선 김이 무엿무엿(무럭무럭) 나는데, 신선로를 둘러 접시, 쟁반, 탕기 등 크고 작은 그릇들이 각기 진미를 받들고 옹위해 선 것이 아니라, 앉았단 말일세.
이것은 소위 교자라. 에헴, '안석'을 등지고 '베개'을 괴고, 무엇을 먹을고 우선 총검열을 하겄다. 다 그럴 듯한데, 급할수록 모름지기 여유가 필요하니 서서히 차려보자. '달걀저냐'를 하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다음으로 어회(魚膾), 또 다음으로 김치, 이러다 보니, '게장'과 '어리굴젓'이 빠졌구나. 이런 몰상식한 놈들을 봤나.』 -49쪽
그런가 하면 소설가 채만식은 1943년 1월 '신시대'에 '명태'를 발표했다.
『명천(明川) 태가(太哥)가 비로소 잡아 팔았대서 왈 명태(明太)요, 본명은 북어(北魚)요, 혹 입이 험한 사람은 원산(元山)말뚝이라고도 칭한다. 빼빼 마르고 기다란 몸 수구장신(瘦軀長身), 피골이 상접, 한 3년 벽곡(辟穀)이라도 하고 온 친구의 형용이다. 배를 따고 내장을 싹싹 긁어내어 싸리로 목줄띠를 꿰어 쇳소리가 나도록 바싹 말랐다. 눈을 모조리 빼었다. 천하에 이에서 더한 악형(惡刑)도 있을까. 모름지기 명태 신세는 되지 말 일이다. 조선 13도 방방곡곡 명태 없는 곳이 없다. 아무리 궁벽한 산골이라도 구멍가게를 들여다보면 팔다 남은 한두 쾌는 하다못해 몇 마리라도 퀴퀴한 먼지와 더불어 한구석에 놓여 있다. 그러니 조선땅 백성들이 얼마나 명태를 흔케 먹는지를 미루어 알리라.』 -21, 22쪽
◆소머리를 푹 고아 우려낸 국물은 최고 자양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접하고 느낀 글도 싣고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밥집은 일본의 선술집과 분위기가 비슷했던 모양이다. 일본인 우스다 잔운은 1909년 '조선만화'(朝鮮漫畵)에 실은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쇠칼을 쳐든 채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재미있다. 무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국물 냄새가 코를 찔러, 눈을 돌리면 주변 가게에는 커다란 진열대 위에 생소머리가 놓여 있다. 국물을 우려내는 소머리가 장식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피가 줄줄 흐르고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밥집의 간판으로는 기발하고 통쾌하다. (중략)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 소머리 국물은 정말 좋은 것으로, 닭고기 국물이나 우유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커다란 솥을 연중 불 위에 걸어놓고 바닥을 비워 씻는 일 없이 매일 새 뼈로 바꾸어가며 물을 부어 끓여낸다. 이 국물, 즉 스프는 아주 푹 끓인 것으로, 매일 끓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부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제하면 아마 세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양제가 되고, 향후 병에 담아 한국 특유의 수출품으로 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9~61쪽
◆배달부와 음식 주문한 사람의 실랑이도
매일신보 기자가 냉면 배달부로 나서서 냉면, 설렁탕, 만두 등을 배달한 체험기도 싣고 있다. 배달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주인이 '땅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라'고 당부하는 모습, 좁은 골목을 자전거 속력을 내 달리다가 부딪혀 넘어지는 이야기, 주문한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다른 그릇에 부어주고 그릇을 되가져오는 장면 등을 묘사한다.
음식을 주문한 사람과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사이에 실랑이는 예전에도 드문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집주인이 배달부가 가져온 장국을 따르다 말고, "아니, 국물이 요고뿐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하고 탁 쏜다. "겨울에는 손님들이 국물을 많이 안 치니 깝쇼." "그건 무슨 소리야? 별놈의 냉면집도 다 봤네. 우리 집에서 냉면을 처음 먹어보는 줄 아나 봐, 참!"
그리고 여자는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린다. 배달부는 추운 날씨에 밖에서 30분이나 기다린다. 그제야 주인은 미닫이문을 열고는 "돈은 내일 받아 가라"고 한다.
책은 음식에 관한 직접적인 글을 비롯해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음식 이야기, 식당 점원이나 배달부 체험기, 팔도명물 음식예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시각에서 여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224쪽, 1만2천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