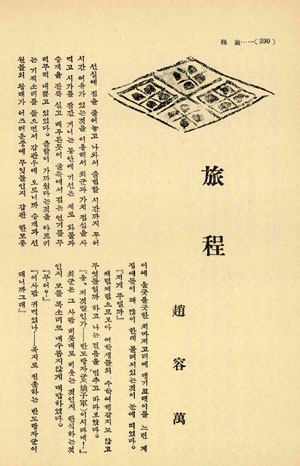
어머니는 1934년생이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그해 소학교에 입학해서 열두 살 되던 5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히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 조선말 대신 일본말을 배웠다. 어머니 집안이 특별히 친일적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창씨개명을 해야 했던 일제 말기 조선 사회의 현실 속에 어머니가 놓여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것은 어머니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강점기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은 일상적이다. 옆집에 세 들어 있던 일본인 가족은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동네 조선인 모두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 일본이 중국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조선 사회 전체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소학교 학생이던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전시 체제를 느낄 일은 별로 없었다.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전쟁에 대한 이해는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단체로 솔방울을 줍거나 풀 뽑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모든 소녀가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들이 겪은 그런 일상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삶이 그렇듯 일상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는 날카로운 현실과 직면하고 있었다. 조용만의 '여정'(旅程'1941. 2.)은 일상의 한쪽 편에서 식민지의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는 조선 소녀들을 다룬 작품이다. 소설은 초년병 기자인 '나'가 중국 대련(大連)행 배 안에서 한 무리의 조선 소녀를 마주치면서 시작된다. 이 수많은 조선 소녀는 가난 때문에 돈에 팔려서 브로커를 따라 북지(北支), 즉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북중국 땅으로 가는 중이었다. '반도낭자군'이라는 기묘한 명칭을 지닌 이 소녀들의 여정의 마지막에는 전쟁에 지친 일본군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소녀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암울하다. 소녀 중 하나가 두고 온 동생을 그리워하며 울먹여도 '나'는 그냥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등을 토닥여주는 것은 물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그냥 암울한 시선으로 그 소녀를 바라볼 뿐이다. '나'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먹이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소설은 끝이 난다. 전쟁으로 삭막해진 군인의 욕망해소용으로 만신창이가 될 그 꽃 같은 소녀들에게 잠깐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나 '나'는 그 누이들을 제국의 남성들에게 무력하게 팔아넘긴 무력하고 무능한 오빠이지 않은가.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 타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조용만의 소설 속 '반도낭자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리라. 참혹한 현실을 겪은 당사자가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왜 그처럼 과거 역사에 매달리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일본의 태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해 냉철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자기정화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현재형으로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재판을 앞두고 역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