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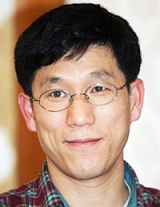
기보배 선수-최여진 엄마 '보신탕 논쟁'
그릇된 '자문화중심주의' 내면화한 꼴
개 식용엔 반대하면서 장난감처럼 버려
반려는 동물을 정서적 관계로 인정해야
"보배가 개고기를 먹는 날이면 경기를 잘 풀어나가더라." 어느 인터뷰에서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근데 기사 제목이 이상하다. '얼짱 궁사 기보배, 보신탕 먹으면 잘 맞아요.' 이 말을 기보배 선수가 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다. 여기에 낚여 모델 최여진의 어머니가 기보배 선수에게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그 후 인터넷에서는 보배 아빠들과 여진 엄마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진 엄마는 문제를 그릇된 방식으로 제기했다 "국가대표란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주지 말아야죠. 외국에선 니네 한국 사람은 개도 먹냐면서 유학 간 학생을 무시합니다." 여기에 유학생에 대한 고려는 있어도 반려동물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도 독특하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국가대표가 그런 한국의 치부를 표현했다는 거죠." 개보다 조국을 더 사랑하나 보다.
사실을 말하자면 외국에서 개를 먹는다고 타인을 '미개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배운 이들은 그런 '자문화중심주의'가 결국 '인종주의'나 '제국주의'의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는 것 정도는 안다. 여진 엄마의 문제는 이 못 배운 이들의 그릇된 시각을 스스로 내면화했다는 데에 있다. 이 미개인의 나라에서 고고하게 정신적 외국인으로 살고 싶었던 걸까?
문제를 그릇된 방식으로 제기했다고 그녀의 분노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내 생각에 여진 엄마는 개의 생명을 올림픽의 메달과 바꿔버리는 행태("보신탕 먹으면 잘 맞아요")에 화가 났던 같다. 다만, 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메달로 표상되는 애국이고, 이 나라에서 애국주의는 논리를 초월한 정서적 호소력을 갖기에,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또 다른 유형의 애국주의에 호소하려 했던 것일 게다.
우리 사회에는 개에 관한 모순된 규정이 공존해 왔다. 즉, 개는 복날 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이자, 동시에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반려자'이다. 과거에 이 두 규정의 충돌은 주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 벌어졌다. 아이들은 특유의 감정이입 능력으로 개와 교감을 나누었으나, 어른들은 애초에 개와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복날이면 무정한 아빠를 원망하는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꼭 개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동물과 정서적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기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이들은 줄고, 개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개와 교감하는 이들은 개를 먹기 위해 죽이는 데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이들의 감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 역시 고양이를 키우며, 가끔 사료로 토끼고기를 주곤 했다. 하지만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를 만난 후 토끼고기를 주는 데에 왠지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나비탕' 밝히는 인간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듯이, 그 역시 고양이 먹이려고 토끼를 죽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다른 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토끼고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또 하나, 잔혹함은 개를 먹는 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개의 식용에 반대하면서도 얼마든지 잔혹할 수 있다. 해마다 휴가지에는 수많은 개들이 버려지고,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버리는 이들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 짓을 하는 것은 개를 '애완동물', 즉 귀여운 장난감 정도로 보기 때문이리라. 장난감은 싫증 나면 버려지기 마련. 장난감은 버려져도 상처를 받지 않고, 망가져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
최근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바꿔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다. '반려'라는 말은 동물을 정서적 관계의 한 상대로 인정하며 그 상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까지 수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의 식용 여부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와 관계를 맺는 우리 사회의 방식을 1인칭-3인칭(생명-사물)의 관계에서 1인칭-2인칭(생명-생명)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